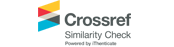Ⅰ. 문제의식의 실타래
조선의 근대시기는 신분체제의 붕괴, 사회질서의 문란, 제국주의의 득세, 서구문명의 유입 등이 혼재하는 격변기였다. 조선이 근대화되는 과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적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조선의 근대화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쓰나미 속에 자기정체성을 찾으려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문호개방 이후에 조선사회는 서양의 타자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새롭게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신종교의 출현과 그 전개의 양상은 조선의 근대적 격변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조선사회는 기존의 전통적 사상과 서구의 근대사상 사이에 간격이나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조선사회 전반에서 표출되는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거나 충족하는 개혁의 과제와 관련된다. 개혁의 과제란 민족생존, 반봉건주의, 부국강병 등과 같이 현세주의적 혹은 구세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이 동일선상에 있는 근대적 사고가 깔려있다. 조선사회는 서구의 사회진화론의 대세를 편승하면서 부국강병의 시대적 절박감과 민족생존의 역사적 사명감을 절실하게 의식하였으며 반봉건주의적 계몽이나 반제국주의적 애국심도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순사상의 강령을 고려할 때, 근대조선에서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그 목표가 대순의 진리를 찾는 것이라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은 대순사상의 진리관(眞理觀)을 모색하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조선의 근대사회에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어려움 속에 근대화의 과제, 즉 민생의 고초, 민중의 불만족, 민권의 불평등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속에서 대순사상의 과업은 진리의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현실적 세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진정한 삶을 모색하는 것이다. 진리란 근대의식의 보편적 관점에서 체득하는 현세주의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는 자아와 타자의 동일선상에서 공감하는 체험의 지평이 열려져있다. 그렇다면 대순사상의 진리관은 현실적 세계에서 공감의 보편적 정서 속에 체험하는 가치지향적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가치지향성의 지평에서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과정을 통해 지상선경(地上仙境)을 추구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세계관, 즉 대순진리관(大巡眞理觀)은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체험의 세계는 공감의 정서 속에 인간의 존재론적 추구와 가치론적 목표가 잘 맞아떨어지는 체험의 차원을 지닌다. 그것은 『주역』의 변통적(變通的) 세계관에서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생명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에는 생명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속에 선(善)과 미(美)의 일체와 같은 심미의식의 생명미학적 경계가 있다.
본고의 핵심적 주제인 원시반본의 강령은 인간이 현실의 유한한 생명력 속에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체험하는 종교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원시반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1)에 따르면 회복, 복고, 회귀 등의 종교적 내용을 지닌다. 이 용어들은 대순사상의 진리의 문제를 과거의 복귀라든가 창조적 복귀 등과 같이 술어의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사상의 진리를 시작이나 근본과 같은 목적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공감(empathy)의 보편적 정서를 통해 종교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적 체험이라야 진리의 가치지향성을 담보할 수 있다.
Ⅱ. 『주역』의 역도(易道)와 변통(變通)의 세계관
인간은 우주와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자생적 호흡을 함께 하며 고유의 본성에 따라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의지를 발휘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자연계의 유기적 연결망에서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을 투사한 세상의 경계이다. 세계의 실재(reality)는 천지의 틀에 대한 입체적 조망을 통해 이해되고 파악된다. 그 과정에서 생명의 이치를 이해하고 생명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의 공동체적 의식을 체득하고 도덕윤리의 가치도 이끌어내었다.
인간은 삶의 여정(旅程)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믿음의 체계에 따라 세계의 실재를 새롭게 경험한다. 세계는 주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경계이고, 세계를 보는 눈, 즉 세계관은 세계를 투사하는 일종의 프리즘의 시야이다. 세계관은 『주역』에서 관괘(觀卦)의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관(觀)의 개념에는 세계의 삼라만상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통찰의 의미가 있다. 관괘의 관점은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주체적 조망에서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으로써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다. 여기에는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차원이 있다. 관의 원리는 대상세계에 대한 관찰, 인식 및 통찰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된다. 즉 대상을 관찰하는 체험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아 내면의 인격적 함양에 힘쓰면서도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대상을 통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관은 특정의 관점이 없는 관점, 즉 보편적 관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2) 이러한 관의 보편적 관점을 통해 대순진리, 후천개벽 및 지상선경의 세계를 조명할 수 있다. 특히 관괘의 취지는 신도설교(神道設敎)의 강령에 집중되어 있다. 「단전」에서는 괘사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은 손은 씻으나 제수를 올리지 않으니 믿음이 있어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아래로 살펴서 교화(敎化)하는 것이다. 하늘의 신묘한 도(道)를 살펴서 사시(四時)가 어긋나지 있으니 성인이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베푸니 천하가 굴복한다.3)
여기에서 제사는 단순히 하늘과의 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교화하고 세상을 계도하는 대의명분의 성격을 지닌다. 군자는 제사의 의식(儀式)을 통해 백성을 순화하거나 교화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천도는 인식의 통로인 반면에 신도는 교화의 통로이다. 천도(天道)의 대의명분에 따라 인도(人道)의 문명을 실현하는 데에 신도(神道)가 교화의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역』의 세계관에서는 우환의식(憂患意識)의 기조 속에 세계의 실재(reality)를 조망하면서 삼라만상의 스펙트럼과 그 변화무쌍한 흐름에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역도(易道)의 원리와 그에 따른 변통(變通)의 방식이 있다. 역도의 원리는 상위 관념으로서 세계의 실재를 인식하는 측면을 지닌다. 반면에 변통의 방식은 하위 관념으로서 세계의 실재를 의식하는 측면을 지닌다. 여기에는 세계관에서 나온 반전의 발상이 있다. 즉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상들과 이들의 변화 속에 대립과 상충을 넘어서 조화와 화해로 나아가는 최적화된 전환의 과정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이 감응하니 만물이 생성된다. 聖人이 人心을 감응하니 세상이 평화롭다. 그 감응한 바를 관찰하니 하늘, 땅, 만물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다.4)
여기에서 자연계의 양상과 그 유기적 연결망 속에 작동하는 직관적 감응의 방식에 주목한다. 성인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실재의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세계의 실재에서 계몽, 계도 및 교화의 적극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현은 감응의 방식을 통한 공감의 정서를 전제로 한다.
『주역』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절기의 순환과 지형의 굴곡에 맞추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며 삶과 죽음의 시공간적 굴레를 체득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 속에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직관적으로 체험한다. 이러한 직관적 체험은 원시반종설(原始反終說)5)에 반영되어 있다. 원시반종의 관점은 유한한 현실적 세계에서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터득한 의식적 체험의 산물이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러러 하늘의 문양을 쳐다보고 구부려 땅의 이치를 살피므로 어둡고 밝음의 연고를 안다. 처음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 정교한 기가 사물이 되고 떠도는 혼이 변하게 되므로 귀신의 정황을 안다.6)
자연계에서 인간은 생명의 유한한 체험 속에 생명력의 지속가능성을 체득한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은 어두움과 밝음의 원인, 삶과 죽음의 굴레, 귀신의 불가시적 현상 등을 통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처음을 본원으로 하고 끝으로 되돌아가므로 삶과 죽음의 설을 안다”는 구절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생명현상으로서 삶과 죽음의 굴레를 체득하는 명운(命運)의 내용이 담겨있다. 인간은 ‘처음과 마침’의 한계(限界)가 존재하지만 ‘본원으로 하고 되돌아가는’ 일련의 체험적 과정을 통해 물리적 생명현상을 넘어서 생명의 존재와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에 확충하여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시반종설은 천문의 불가역적(不可逆的) 시간성 속에 인문의 가역적 시간성을 체험하는 인간의식의 차원을 지닌다.
역(易)의 상위 개념에 대비되는 하위개념으로서 변통의 관념이 있다. 그것은 궁변통구(窮變通久)의 과정을 축약한 말이다. 궁변통구의 방식은 존재의 변화가능성, 인식의 실천가능성 및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통합적 차원을 지닌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7)
사물의 변화, 상황의 진행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궁변통구의 연속적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8) 이러한 변통관은 인간사회의 존재 및 그 변화 속에 질서와 조화의 체계와 연관시킬 수 있다. 그것은 문명사회의 성격과 그 발전사관의 차원과 관련된다. 즉 역사의 발전이란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진행하는 가치지향적 추세를 특징으로 한다.
변통(變通)의 원리는 세계의 실재에서 변화무쌍한 생명력이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원리이다. 이 원리에 관해 「계사전」에서는 서술한다.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말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善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을 性이라고 말한다.9)
자연계의 유기적 연결망은 음양의 역동적 생명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을 지닌 만물의 본성이어야 선(善)의 지속가능한 가치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양의 범주는 모든 생명체의 본성과 그 보편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통로가 된다.10)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연계에서 작동하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균형과 평형의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세계의 실재에서는 음과 양은 한 번씩의 시의적절한 시간적 흐름에 맞추어 현상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즉 음과 양이 역동적인 통일적 관계에 따라 음도 하나이고 양도 하나라는 순환적 고리가 창발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창발적 원리에 따르면, 음양의 방식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생명력의 과정에서 선순환적 가치가 발현되며 모든 생명체에서 온전한 본성으로 자리잡는다. 음양의 역동적 흐름은 변화와 안정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의 변화는 음양의 균형적 방식으로 나타내며 사회의 안정은 음양의 평형적 방식으로 나타낸다. 이들이 교차하는 쌍곡선에서 사회의 발전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온전한 본성은 음양의 방식에 따른 조화와 화합의 가치지향적 의식을 형성한다. 이 가치지향적 의식은 우주의 생명력과 충만하게 합치한다는 의미에서 심미의식(審美意識)에 해당한다. 그것은 공감의 보편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공감은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 정서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서 공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조절의 능력을 갖고서 생명정신의 심미의식적 세계를 체득할 수 있다.
Ⅲ. 대순진리관(大巡眞理觀)과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생명정신
대순사상의 세계관, 즉 대순진리관은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천하대순(天下大巡)의 차원에서 그것은 세계의 실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가치지향성을 지닌다. 그 진리관은 천하대순의 가치지향적 차원에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계, 지상선경(地上仙境)의 경계 및 그 양자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은 천하대순의 가치지향성의 차원에서 후천개벽의 세계를 주체적으로 개척하여 지상선경의 경계에 현세적으로 도달하는 취지를 지닌다.11) 후천개벽이 방법론적 성격을 지닌다면 지상선경은 목적론적 성격을 지닌다. 천하대순의 조감도(鳥瞰圖)에서 후천개벽과 지상선경의 관계는 목적의 방법화이자 방법의 목적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순진리관에서는 조선사회에서 근대화의 변화가능성 속에 민중의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 민권의 가치지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후천의 개벽을 통해 봉건적 말세를 끝내고 민생의 계몽, 민중의 교화, 민권의 계도를 통해 지상선경의 현세적 세상을 구현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특히 선천(先天)시대에 억압된 삶을 뒤로 하고 후천(後天)시대를 개벽하여 민생의 상생적 차원에서 해원(解冤)의 민중해방을 통해 보은(報恩)의 민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히 후천의 개벽은 조선의 근대적 전환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삶과 죽음의 굴레 속에 인간이 개척해야 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있다. 후천의 개벽은 이와 같은 진정한 모습을 찾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이다. 이는 잘못 인식된 근대세계의 개조와 관련된다. 개조란 천지공사를 통해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제국주의를 저지하는 조선사회의 근대화이다. 즉 현실의 삶에서 후천의 개벽을 거쳐 계몽, 계도 및 교화의 근대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천지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지상선경의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에서 민생의 계도, 민중의 교화 및 민권의 계몽을 주도하는 열린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이거나 관념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현세주의적 삶과 관련된다. 현실적 세상과 이상적 염원 사이에 격차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전통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를 조화시키는, 양분법의 극단을 극복하는 탈경계성의 지평이 열려있다. 여기에서는 현세적 삶이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후천개벽의 선험적 노선을 따라 민생, 민중 및 민권을 민족의 연장선상에 놓아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계(三界)의 개벽과 천지공사는 현실적 세상에서 반봉건주의적 평등사상이나 반제국주의적 민족의식 하에 개벽의 선험적(pre-experiential) 통로를 따라가며 지상선경의 세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진리관은 조선사회의 근대적 전환기에 더 좋은 세상의 시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민중이 주체의식을 갖고서 민생을 자율적으로 살리면서 민권을 견실하게 확립하는 근대적 사고의 취지를 지닌다.12)
이러한 점에서 대순진리관은 천지의 한정된 시공간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후천개벽의 세상에서 조선사회의 근대화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유한한 생명력 속에서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바라본다. 이는 현실의 세계를 초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세계에서 또 하나의 현실적 공간을 창출하여 현실과 이상을 함께 아우르는 대순사상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순진리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로서 원시반본설이 있다. 원시반본설에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유한한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이러한 조건 자체가 인간의 생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원시반본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해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 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13)
여기에서는 동아시아의 고대에서 중고(中古)시대14) 이후에 정치적 통치[俗]와 종교적 교화[聖]가 분리되었던 사회상을 전제로 하여 조선사회의 근대화의 문제를 설명한다.15) 통치와 교화 혹은 영웅과 성인이 분리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분열되면서 진정한 삶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선사회의 경우에 후천의 시대에 들어와 통치와 교화가 함께 합치되어야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는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을 통해 군사위(君師位)가 일체가 되는 통합과 화합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아와 타자가 일체를 체험하는 탈경계적 성격을 지닌다. 근대적 인간은 인간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속에 생명의 이치가 도덕의 가치까지 고양될 수 있는 생명정신의 의식의 충만감과 관련된다.
원시반본설(原始返本說)은 인간이 현실의 유한한 생명력 속에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내용을 지닌다. 원시반본은 기존의 연구들16)에 따르면 회복, 복고, 회귀 등의 종교적 내용을 지닌다. 원시반본의 용어에는 일반적으로 시작을 본원으로 하고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종교적 체험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 용어들은 대순사상의 진리의 문제를 과거의 복귀라든가 창조적 복귀 등과 같이 술어의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용어의 해석에서는 시작이나 근본과 같은 목적어의 대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작을 본원으로 한다”는 말에는 중고시대에 정교일치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근본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에는 그러한 사회에서 체득할 수 있는 인간사회가 공유하는 공감(empathy)의 정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의 취지는 종교적 체험의 의식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원초적 대상에 대한 공감(empathy)의 보편적 정서를 통해 종교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적 체험이라야 진리의 가치지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순사상에는 진리의 종지(宗旨)와 그 가치지향성이 있다. 인간은 유한한 자연의 생태계 혹은 천지의 틀 속에서 무한한 우주의 생명정신을 만끽하고자 한다. 원시반본의 취지는 이러한 생명정신의 가치지향성을 지닌다. 원시반본은 우주의 본원적인 것에 복귀하거나 회복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본원적인 원초성을 의식적으로 되새김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의식의 원초적 본원을 되새김하는 종교적 체험과 관련된다.
‘처음과 근본’에 대한 의식적 체험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인간 스스로 지상선경의 달관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달관적 경지는 관(觀)의 보편적 시계를 통해 경험의 유한적 세계 속에 전체와 통합의 무한적 세계를 체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유한성을 우주의 생명의 무한성으로 확장하여 삶과 죽음의 굴레 너머에 있을 것 같은 생명정신의 지속가능한 지평을 바라본다. 따라서 대순진리관은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에서 체득한 생명정신의 가치지향적 차원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원시반본(原始返本)의 논제는 『주역』의 세계관에서 불가피하게 인식하는 원시반종(原始反終)의 굴레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원시반종은 세계의 실재(reality)에서 존재하는 명운(命運)의 양립가능성, 즉 불가항력성과 예측불가능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 속에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에 확충하여 삶과 죽음의 현실적 굴레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는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과 일맥상통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거쳐서 선천시대에 억압된 삶을 뒤로 하고 후천시대를 개벽하여 민생의 상생적 차원에서 해원(解冤)의 민중해방을 통해 보은(報恩)의 민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원시반본의 대순진리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문명과 문화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17)
여기에서는 조선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서구문명과 같은 말단적인 대상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본원에서 모색하려는 것이다.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조선사회의 근대화에서 후천의 개벽에 대한 의식적 차원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물질적 세속적 세계를 극복하고 이미 상실된 문화의 정신적 세계를 체험하여 문명의 근대화를 위한 의식적 체험을 고양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인간은 무한한 우주의 생명력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천지공사를 바탕으로 하는 지상선경의 경지는 바로 후천의 개벽 속에 원시반본의 생명정신과 같은 의식적 체험에서 가능한 것이다. 원시반본의 생명정신은 무한한 우주의 생명력과 호흡을 함께 하며 인간사회의 유한한 생명력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과 관련된다. 자연계에서 인간은 생명의 율동이 자연스레 발현하는 본성에서 만족감이나 충족감의 정서를 만끽한다. 인간은 공감의보편적 정서를 통해 생명현상의 불가역적(不可逆的) 세계가 생명정신의 가역적(可逆的) 세계로 고양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신적 만족감 혹은 충족감에서 나오는 심미의식, 즉 생명의 율동이 자연스레 발현하는 본성의 가치를 체득한 내면적 심미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후천의 개벽을 통해 도달하는 지상선경의 달관적 경지는 여기에서 성취될 수 있다.
지상선경의 경계라는 것도 인간이 본래 완전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완전한 존재를 회복하고자 깨닫고 이해하고 터득하는 의식적 차원을 지닌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변통의 지속가능한 과정을 거쳐야 대순의 진리를 바라다볼 수 있으며 지상선경의 경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른바 원시반본의 사상은 이러한 가치론적 신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생명력의 율동이 발현하는 본성에서 체득한 생명정신의 결정체이다. 조선의 근대사회에서 이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삼차원적 통일성, 즉 통합과 화합의 세계와 관련된다. 인간이 자신의 온전한 본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터득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Ⅳ. 후천개벽관(後天開闢觀)과 궁변통구(窮變通久)의 생명의식
자연계에서 삼라만상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진화의 과정은 혼돈에서 질서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천지의 현상 속에 진행된다. 그것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창조18)의 조화(造化)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개벽의 조화로 귀착된다.19) 이러한 개벽을 통해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개벽의 관념은 생명활동의 시공간적 계기의 과정에 대한 직관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개막이나 문명의 개화나 도의(道義)의 입문처럼 특정의 시대를 전환하는 의식적 계기나 관문으로 상징된다. 대순사상에서는 개벽의 관념을 통해 조선의 근대사회의 전환점, 더 나아가 민족의식의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벽의 과정은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논법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사와 역사, 혼돈과 질서, 전통과 개혁 등의 대립적 범주가 존재한다. 특히 후천의 개벽은 후자의 범주에서 세상을 계몽하거나 계도하는 관문으로 상징화된다.
이와 연관하여 대순진리관은 후천의 개벽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우선 후천의 개벽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개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 .20)
천지인의 삼계의 개벽은 인간의식의 차원에서 시공간적 과정,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공간이 전개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비겁의 현실적인 유한성을 넘어 개벽의 현실적 변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로다.21)
여기에서 상제는 세상을 주재할 수 있는 존재이자 후천의 개벽을 관할할 수 있는 존재이다. 개벽은 근대의식의 차원에서 역사의 혁신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상제가 주재하는 천지공사라는 것도 삼계를 개벽하는 공적에 해당한다.
후천의 개벽은 문명사회의 관문으로서 민생의 계도와 민중의 교화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후천의 영역에는 사회적 실천에 따른 사회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 .”22)
선천의 영역에서는 상극의 악순환적 방식이 진행되므로 원한의 풍조가 삼계에 가득 채워진다. 천지의 틀을 유지하는 자연의 이법이 무너지고 온갖 재난이 생겨나 말세의 지경이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선천의 운행에서는 천지의 질서가 무너짐에 따라 사회적 모순과 투쟁이 극렬하게 벌어지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을 통해 왜곡된 악순환의 진화론적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후천의 세상이 도래하여 상생의 도가 바로 잡혀 올바른 세상23)이 열린다. 그 열린 세상이 바로 지상선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의 실재는 전통적으로 음양의 원기(元氣)에 따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 오행의 연관체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오행의 체계에서 특히 수와 화의 현상은 자연의 이법이 작동하는 생명력의 기제이다. 특히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은 오행의 원리에 따라 상생과 상극이 교차하는 순환적 시간의 역정(歷程)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오행의 연관체계는 상극과 상생의 역동적 순환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시대의 변화는 오행의 연관체계 속에 상극과 상생이 교차하는 순환적 과정, 즉 상생의 선순환적 과정과 상극의 악순환적 과정을 지닌다. 사회가 불안정할 때에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속에 사회적 모순과 투쟁이 극렬하게 벌어지는 상극적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러나 후천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사회는 천지의 개벽을 통해 상생의 통로를 찾을 수 있다. 천지의 정상적 틀 속에 신명의 조화(造化)를 통해 원한의 맺힘을 해소하고 상생적 선순환이 진행된다. 이러한 후천의 개벽에서야 비로소 도통진경(道通眞境), 즉 지상선경의 화합과 통합의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에서는 조선의 근대사회가 내우외환의 일시적 현상을 극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최적의 열린사회로 향할 것임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근대의식 속에 문명사관(文明史觀)의 가치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삶과 죽음의 주기적 굴레 속에 그 경계선 너머를 바라보며 자신의 유한한 생명력을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확충하였다.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을 자연계에 투영한 의식의 산물이 바로 후천개벽이다. 인간은 천지의 개벽과 같은 전환적 계기 속에 자연계에 대한 경외(敬畏)나 우환(憂患)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되돌아본다. 이러한 생명의식의 체험 때문에 인간은 삶과 죽음의 물리적 굴레를 넘어 후천개벽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다.
후천의 개벽은 현실적 삶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은 개벽의 통로를 통해 인간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한다. 대순의 진리관은 후천의 개벽으로 상징되는 세계의 조화(造化)를 지향한다. 진리의 방향성은 후천의 개벽으로 표현되며, 이는 근대화의 시대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시사한다. 천지의 개벽이 역사시대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반면에 후천의 개벽은 역사시대의 변혁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즉 전자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전환으로서 혼돈으로부터 벗어나는 문명의 개화를 시사한다면 후자는 역사의 근대적 전환으로서 봉건사회로부터 벗어나 문명의 진보를 시사한다. 그 양자는 모두 문명사회의 가치지향성을 지니지만 후자는 근대의식과 사회적 개혁에 중점을 둔 것이다.
후천의 개벽은 공감의 보편적 정서를 통해 대순의 진리를 체득하는 생명의식의 체험적 통로이다. 이를 관(觀)의 시계에 적용하면, 민생을 계도하고 민중을 교화하는 세계의 개조를 도모하는 개벽의 열린사회를 바라다볼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목적은 현실적 삶의 제약 속에 인간이 스스로 참다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세계의 조화(造化) 혹은 개벽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Ⅴ. 지상선경관(地上仙境觀)과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생명미학
조선의 근대사회에서는 민중, 민생 및 민권을 근대화의 가장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사상적 지주가 필요하였다. 신종교는 바로 이러한 근대의식의 산물이다. 그것은 민중의 현실적 절실함, 민생의 시대적 절박함, 민권의 사상적 추세 등의 문제의식에서 등장하였다. 대순사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려는 취지와 희망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대순사상에서는 후천의 개벽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책무라고 생각하였다. 후천의 개벽은 계몽이나 계도를 위한 통로로서, 해원(解冤)을 통한 상생의 창발적 통로로 표현된다. 이러한 통로가 바로 근대화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넘어 해소와 조화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지상선경의 지평을 바라다볼 수 있었다. 이러한 지평에서야 비로소 상생의 인간사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공생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
대순사상은 민생, 민권 및 민중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적 사명감에 따라 사회적 모순과 충돌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사회적 정서의 공감력을 확충하며 공생과 화합의 유대감을 도모하였다. 여기에서는 일정한 위계적 질서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자생적 유기적 질서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즉
하늘과 땅의 일이 모두 이 음과 양 속에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이 음과 양 속에 완수된다. 하늘과 땅은 음과 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과 사람은 음과 양으로써 造化를 이룬다.24)
여기에서는 천도(天道)의 변화와 인도(人道)의 개조를 음양의 관계로 설명한다. 최근에 대순사상의 연구에서는 음양의 역동적 관계를 ‘음양합덕(陰陽合德)’25)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양합덕의 용어는 대순사상에서 전거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충분한 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26) 음과 양의 대립과 통일의 관계는 『주역』의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방식과 주희(朱熹)의 대대(對待)의 속성과 유행(流行)의 흐름27)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계의 실재는 음과 양의 균형(balance)과 평형(equilibrium)을 통해 변화와 안정이 교차하는 생명력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은 양이고 神은 음이다.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에 변화의 도가 있다. 변화의 術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神과 明에 좌우된 것이다. 신과 명을 감응하여 소통한 다음에 그 일에 전념하면 크나큰 仁과 크나큰 義라고 말한다. 전념하는 데에 결단한 다음에 변화의 도가 있다.28)
여기에서는 음과 양의 방식에 따라 천도가 인도로 구현되는 변통(變通)의 방식을 설명한다. 음과 양이 화합하는 방식은 신(神)과 명(明)의 관계로 이해된다. 신은 천상계에서 변화하는 음의 작용을 가리키고 명은 지상계에서 변화하는 양의 작용을 가리킨다. 세계의 실재에서는 신의 비가시적 작용은 명의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삶은 신과 명의 연결을 감응하고 소통하는 의식적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자각의식은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서 인의(仁義)의 도덕적 본성으로 발양된다. 여기에서는 음양의 범주를 활용하여 세계의 조화(造化)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대순사상에서 민생, 민중 및 민권은 민족의 연속선상에서 상생의 선순환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9)
수, 화, 목, 금이 때를 기다려 이루어진다. 불은 물에서 생겨나므로 천하에 상극이 없는 이치이다.30)
수와 화의 자연현상은 자연의 이법에서 생명력을 표출하는 기제이다. 오행의 연관체계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작동하는 원기(元氣)의 범주는 음양이다. 음양의 범주와 오행의 연관체계는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사의 법칙과 관련된다. 음과 양의 대대(對待)와 그 유행(流行)의 과정은 천지의 틀 속에 오행의 연관체계로 발현된다. 여기에는 음과 양의 시의적절한 연결고리는 오행의 순환적 흐름을 창출한다. 오행 중에 수와 화의 연관은 이러한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이러한 수화의 현상적 방식에 따라 선천의 시대에 문명의 생명력이 다 소진하여 후천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31)라고 말한다.
수(水)의 기운은 천지의 틀 속에 생명력의 원류이다. 그것은 삼계(三界)에서 상생의 기운으로 흐르고 상극이 없는 천지공사의 토대가 되며 궁극적으로 후천의 시대를 개벽한다. 즉 원시반본의 의식적 관념을 통해 중고시대에 문명의 고유한 원형을 회복하고 정신적 기질의 개벽을 발휘하여 지상선경의 지속가능한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역사의 정통성과 대의명분은 상생의 선순환적 과정에서 도모하고 확립된다. 대순진리관은 이처럼 상생의 선순환적 구조에 착안한 것이다.
음양의 범주에 따른 변화의 도는 『주역』의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역도(易道)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역도는 음과 양의 대대(對待)와 유행(流行)의 관계 속에 조화(造化)의 균형과 평형의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음은 양을 따르고 양은 음을 이끄는 통합과 화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균형이나 불평형이나 불평등과 같은 억음존양(抑陰尊陽)의 상극적 양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대순사상에서 이러한 상극적 양상은 선천(先天)시대의 잔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음양의 역동적 관계는 자연과 사회의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고 인간의식의 차원에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통로가 된다.32) 그러므로 대순사상의 진리관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천도(天道)에 입각하여 상생의 인도(人道)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이는 신명조화(神明造化)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공감의 보편적 정서를 통한 원융관통적 심미의식(審美意識)과 관련된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의 논법은 남녀차별, 반상차등(班常差等) 등의 봉건적 폐습을 해소하기 위한 근대의식의 원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남녀차별의 경우에 선천과 후천을 구분하는 계기를 통해 설명된다. 선천시대에는 건존곤비(乾尊坤卑) 혹은 억음존양(抑陰尊陽)의 방식에 따라 남존여비의 폐습이 있었으나 이제 후천의 시대에는 건곤일체(乾坤一體)의 방식에 입각하여 남녀평등의 근대화를 달성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 .33)
여기에서 해원(解冤)의 궁극적 단계는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근대사회를 가리킨다. 이 시대는 후천의 개벽과 같은 열린 체계를 지닌다. 건곤의 구도는 우주의 이법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틀로서, 조선사회가 운용되는 사회공학적 대강령에 해당한다. 이른바 후천의 시대에는 음양의 상보상성(相補相成)의 방식에 따라 건곤의 대강령을 새로이 확립하고 남녀평등의 예법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34)
후천의 시대에는 해원의 공덕(功德)에 따라 남존여비의 관습도 폐지되어야 인존(人尊)의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35)라고 말한다.
대순사상은 조선의 근대사회를 위한 시대적 압박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서 개혁의 실천에서 현세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닌다. 강증산은 서구의 진화론적 문명관에 대한 회의와 그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 .36)
조선사회는 근대화의 시대적 명분하에 전통적 관념과 서구적 문물 사이에 대립과 충돌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는 조선의 근대사회의 문제의식이 동도서기(東道西器)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 민족을 위한 근대화를 추진할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제생 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災民革世)는 웅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민 정세하리라 … .37)
여기에는 조선이 극복해야할 내우외환의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 성인의 구도(求道)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한 상생의 취지를 지닌 반면에 영웅의 패술(覇術)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상극의 취지를 지닌다. 전자가 대순사상은 민중의 교화와 천하의 평안을 도모하는 성인의 구도를 지향한다.
대순사상의 세계관에서는 상극과 결원(結冤)의 억압으로 얽매인 선천의 세상, 상생과 해원(解冤)의 해방으로 열려진 후천의 지상선경, 전자에서 후자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나뉜다. 특히 지상선경은 바라만볼 수 있는 천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지상에 천상을 구현해 놓은 세계, 즉 천상이 변형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찢겨진 조선후기 사회의 시대상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선천의 결원은 모든 재앙의 원천이므로 해원의 과정을 거쳐 포용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극과 상생의 현실적 대립을 넘어 결원이 해소된 해원의 상태로서의 지상선경의 지평을 바라다볼 수 있다. 이는 조선사회가 당면한 민생, 민중 및 민권의 근대화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반영한다.
강증산이 보건대, 조선의 근대사회에서 민생 혹은 민중의 원한은 근대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장기간 세월 속에 누적된 결과이다. 현재는 단순히 삶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열린 공간 속에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하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 속에 있다. 인간은 과거의 누적을 통해 현재의 과정 속에 미래의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이란 것은 마땅히 왕성히 천지에 있다. 반드시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는 인간을 낳아 쓴다.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가 인간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38)
천지공사는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우주의 조화(造化)에 따른 천·지·인의 삼계의 공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근대사회는 사회진화론의 흐름 속에 공존, 조화 및 화합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는 자아와 타자의 연속선상에 있는 노선, 즉 타자의 자아화와 자아의 타자화의 통합적 지평과 맞닿아 있다. 이는 음양의 논법을 통해 설명한다.
천지의 일[天地之事]은 모두 음양 가운데 이루어지고[陰陽中有成], 만물의 이치[萬物之理]는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진다[陰陽中有遂].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룬다[天地以陰陽成變化].39)
모든 존재는 생명의 원천과 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천도의 통일적 원리에 따른다. 이 통일적 원리란 개체의 생명의 자생력과 그 연결망을 가리킨다. 그것은 신진대사와 세대교체를 통대로 하는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원리로 표현된다. 천도의 운행의 과정에서 보자면, 어떠한 존재라도 그 고유한 성질을 지니며 이 성질이 본성을 형성하여 생성, 변화와 같은 존속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생명의 존속과 관련한 권리나 이득이 존재의 유기체적 생명력의 합목적성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물의 이치[萬物之理]는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진다[陰陽中有遂]”고 말하는 것이다.
선천의 시대에는 상극의 원한이 누적되면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후천의 시대가 도래하면 상생과 공생의 협력을 통해 공존공영의 화평한 세상이 열린다. 여기에서 해원(解冤)과 보은(報恩)과 같은 참다운 삶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40)
천지공사는 조선의 근대사회를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다. 천지공사가 완수되어야 비로소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선경을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은 사계절과 같은 천도(天道)의 운행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의(仁義)와 같은 인도(人道)의 사회질서에 맞게 주체적 신념을 가져야 비로소 민생의 교화나 민중의 계도를 실천할 수 있다. 강증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 .41)
후천의 시대에는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천도(天道)의 운행에 따라 인도의 규범적 질서에 맞게 민생의 교화나 민중의 계도를 실천할 수 있다. 세상의 교화나 계도는 신도(神道)의 취지, 즉 천도를 본받고 인도를 실현하는 취지와 맞물려 있다. 특히 성인은 관괘(觀卦)의 취지, 즉 신도설교(神道設敎)의 가르침을 통해 민심을 얻고 민생을 구현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발전사관은 선사(先史)의 혼돈시대에서 역사의 질서시대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과정으로 특징짓는다. 대순사상에서 이러한 과정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개벽하는 근대의 시대적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 ”42)
조선의 근대사회는 반제국주의의 기치 하에 민족의 계몽을 고양하는 역사적 사명감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반봉건주의의 구호 하에 민생의 계도와 민중의 교화를 도모하는 시대적 절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사회진화론의 발전사관 속에 전통의 중건(重建)과 근대의 전환의 양립가능성에 빠져있었다. 그 속에서 대순사상은 신분질서의 모순과 갈등을 넘어 민생의 삶을 구현하려는 현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는 후천의 개벽이라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강증산은 천지공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 .43)
그는 천지공사 이전에 존재하는 선천의 세계와 그 이후에 존재하는 후천의 세계를 나눈다. 특히 후천의 개벽을 통한 지상선경의 경지는 천지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선경은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으마 시대가 잘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 천지공사는 순리에 맞게 개벽의 통로를 따라 진행되어야 민생에 폐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는 인간의 삶을 위한 현세적인 성격을 지닌다.
천지공사는 민중이 주체적 의지를 갖고서 삶을 개척하는 개벽의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여기에는 대순사상에서 결원(結冤)과 같은 원한의 맺힘과 해원(解冤)과 같은 해소의 과정이 있다. 즉 결원(結冤)과 같은 대립과 충돌의 관계를 넘어 해원(解冤)과 같은 조화나 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에서는 종교의 이상적 보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민생이나 민중의 강렬한 현실적 욕구에 더 치중한다. 특히 해원(解冤)이라는 말은 인간 삶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삶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해원의 원(冤)은 인간의 욕구를 갈구하는 현실적인 삶 자체를 함축적으로 상징한다. 해원은 시대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생명력과 같으며 결코 완결될 수 없는 지속가능한 흐름과 같다. 삼라만상이 상생의 통로를 찾고 신명(神明)의 조화(造化)44)를 창출하여 억원(抑冤)을 해소하고 상생의 선순환을 진행하여 조화와 화합의 경지로 나아간다. 개벽은 세상을 새로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전환적 계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상선경은 천상의 이상세계가 아니라 천지공사의 토대위에 세워지는 조선의 바람직한 근대사회 그 자체이다. 지상선경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 관념적 혹은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라 민생, 민중 및 민권을 위한 바람직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세계를 지향하는 대순진리관은 후천의 개벽을 통해 민생과 민중을 위한 더 좋은, 최적의 세상의 경계를 찾는 것이다. 즉 민중은 민생을 이끌고 민생은 조화와 화합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 상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상생의 삶으로 승화되면서 평등의식의 민권으로 확충되고자 하는 것이다.45)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시대에 경험했던 인간의 무도한 삶을 진단하고 후천시대를 개벽(변혁)하기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해원(解冤)을 진행하고 보은의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선천의 현실인식 속에 후천의 개벽을 통해 존재와 가치 혹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넘어서는 탈경계적 가치지향성을 모색한다. 대순진리관은 종교의 보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민생이나 민중의 강렬한 현실적 욕구를 찾는 것이다. 특히 해원(解冤)이라는 말은 인간의 현실적 삶을 수용하면서 삶의 실현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해원의 원(冤)은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사상은 해원의 해소를 통해 신종교가 모색하는 현세적 가치의 진리관(眞理觀)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강증산은 조선사회의 내우외환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결국에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확신한다. 천지공사는 이러한 신념을 구현하는 작업이며 지상선경은 이러한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종적인 단계이다.
…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 .46)
지상선경은 천지공사의 설계가 시행되어 선천에서 후천으로 진화하는 일련의 개벽의 결과이다. 즉 상극과 원억(冤抑)을 넘어서야 체험하는 천지의 대변혁, 즉 개벽을 거쳐 상생하는 후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온 사회구조적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道)로써 후천의 세상을 열어 지상선경 속에 민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명사회의 역사적 진화가 시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선천의 선사(先史), 즉 미문명사회에서 후천의 역사, 즉 문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후천의 개벽은 남여나 반상의 신분과 같은 상극의 대립이나 원억(冤抑)의 충돌을 극복하는 통합과 화합의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삶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47)
문명사회의 발전적 과정에서 상극의 원한이 쌓이면 상생의 선순환이 막히면서 결국에 인간사회의 멸망을 가져온다. 역사의 시간적 계기에 따르면, 과거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에 누적되고 미래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 연속된 결과이다. 이러한 시간성 때문에 인간사회는 혼종과 창신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원한의 누적을 해소하는 해원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해원의 과정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해소조차도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원의 공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향하지만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민족의식의 생명력을 토대로 해야 한다. 특히 지상선경의 현세적 경지에서는 계급이나 민족의 상충이나 갈등을 해소와 화해의 열린 세계를 계도하고 교화한다. 열린 세계란 보편적 정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족공동체적 유대감을 결성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 즉 후천의 개벽이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의 진리관에서는 조선의 민족이 불가역적(不可逆的)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역적(可逆的) 생명의 시간을 원만하게 충족할 수 있는 심미의식의 경지를 체험하기를 고대한다. 여기에는 민생, 민중 및 민권이 생명력의 연속선상에서 고양되는 생명미학의 원융관통적 차원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에 사회진화론에 따라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각기 자기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계승하면서 각각 고유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룩하였으나 각각의 특색 때문에 오히려 국가 혹은 민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조선사회는 각국의 문화들의 고유한 핵심적 내용을 통합하여 새로운 후천의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48)
이 경지가 바로 음과 양이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一陰一陽]” 서로 조화와 통합의 덕성을 특징으로 하는 원융관통의 세계이다.49)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50)
조선 후기에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천지공사를 통해 지상선경의 경계를 지향한다. 그 경계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지상선경의 현실적 공간이 창출된다. 과거의 역사적 원한이 장기간 쌓이면 결국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원한을 해소하는 것이 장차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전제조건이 된다. 이른바 상생의 해원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상선경의 경계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한 공감력을 확충하며 유대감을 확장할 수 있는 심미의식의 생명미학적 경계와 맞물려있다. 이는 고전적 유토피아처럼 인간이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관념적인 이상적 경지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불가역적(不可逆的) 시간의 현실적 세계에서 가역적(可逆的) 시간의 가상적 세계를 바라다보며 민생, 민중 및 민권이 민족의 동일선상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성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바라다볼 수 있다.
Ⅵ. 문제해결의 실마리
조선 후기에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대순사상은 보편적 정서의 공감대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또 하나의 현실적 공간을 찾아내야했다. 현실적 공간이란 민생, 민중 및 민권의 근대적 기조 하에 천지공사의 작업을 통해 후천의 개벽으로 상징되는 체험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가리킨다. 대순사상에 따르면, 선천의 굴레를 벗어나 신명과 화합하면서 삼계의 대권을 주관하여 억원(抑冤)을 풀고자 하였다. 또한 상생의 도로써 후천의 개화시대를 열어 민중의 의식을 바꾸고 민생의 현실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평등한 민권의 지상선경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인간의식의 근대적 개조를 통해 현세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열망과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른바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인간의 온전한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민생, 민중 및 민권의 입체적 차원에서 진정한 근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은 자연계의 생명력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직 및 문화의 활동 및 심지어 도덕성이나 윤리의식도 고양시킬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의식적 체험에서 심층적인 내면적 세계를 성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에 기초한 생명정신의 차원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문제의 심층적 바탕이나 기조에도 깔려 있다. 그 속에 원시반본의 생명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건전한 인간의 생활방식과 행동양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윤리도덕적 의식의 영역까지도 확충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진리관에서 원시반본의 의식적 체험은 인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 만남의 연속, 소통의 지속을 통해 민생, 민생 및 민권의 통일적 차원, 즉 지상선경의 경계를 성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생명의 율동이 자연스레 발현하는 본성의 가치를 체득한 내면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생명력을 통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의식적 체험의 차원을 지닌다. 이러한 체험 속에 생명공동체의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추구와 가치론적 목표가 잘 맞아떨어진다. 여기에서 생명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 속에 선(善)과 미(美)의 일체와 같은 심미의식의 생명미학적 경계를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