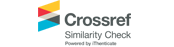Ⅰ. 서언
『전경』1)은 1974년 4월 1일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교무부(敎務部)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총 일곱 개(個) 편이다. 「행록(行錄)」, 「공사(公事)」, 「교운(敎運)」, 「교법(敎法)」, 「권지(權智)」, 「제생(濟生)」, 「예시(豫示)」로 되어 있다. 『전경』을 장(章)으로 보면 「행록」 5장, 「공사」는 3장, 「교운」은 2장, 「교법」은 3장, 「권지」는 2장, 「제생」과 「예시」는 복수(複數)의 장이 아닌 1개 장이 한 개의 편을 이루고 있다. 이에 장으로 보아 『전경』은 17개 장이 된다.
『전경』 각 편의 형식을 보면 「행록」은 총 5장 96면으로 되어 있으며 총 구절 수는 223절로 1장은 38절, 2장은 24절, 3장은 66절, 4장은 57절, 5장은 38절로 되어 있다. 「공사」는 총 3장 55면이며 총 구절 수는 106절로 1장은 36절, 2장은 28절, 3장은 42절로 되어 있다. 「교운」은 2장 69면으로 되어 있는데 총 구절수는 133절이며 1장은 66절, 2장은 67절로 구성되어 있다.
「교법」은 총 3장 41면으로 173절로 1장은 68절, 2장은 58절, 3장은 47절로 되어 있으며 「권지」는 2장 28면으로 총 구절 수는 71절로 1장은 33절, 2장은 38절이다. 「제생」과 「예시」는 장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제생」은 44절 21면이며 「예시」는 89절 30면이다.
한편 「행록」은 5장 223절 96면이고 「행록」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12장 616절 244면이다. 「행록」은 『전경』의 면수(面數)에 있어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절 수에 있어서도 3분의 1정도이다. 「행록」을 제외하면 구절 수에 있어서는 「교법」이 173절(41면)로 가장 많으며 면수로 보면 「교운」편이 69면(133절)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교운」 2장이 도주(道主)에 관한 기록인 것을 생각하면 면수에 있어서는 「공사」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제에 관한 기록에 있어 기록의 양으로는 「공사」가, 구절 수를 보았을 때에는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교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사」가 상제의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종교적 행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법」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요소로 중요하다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법」구절의 변이(變移)의 측면에서 살펴 볼 『대순전경』을 보면, 『대순전경』 초판(初版)이 일제 강점기인 1929년 발간된 이래로 1965년 까지 6판을 마지막으로 이상호에 의해 증산 관련 기록이 마무리되었다. 『대순전경』은 장으로 나누어 구절을 수록하고 있는데 초판의 13장을 거쳐 재판에서는 10장으로 3장이 줄어들었으며 3판에 와서 9장이 되어 6판까지 9장으로 정착되었다. 장별 기록 내용은 판본의 변화에 따른 구절 수의 증가가 말해주듯이, 초판의 499절이 재판에서 611절이 되었고 3판과 4판에서는 731절로 증가되었으며 748절로 구절이 많이 증가되지 않은 5판을 거쳐 6판에 와서는 861절로 되어 최종 전승이 정착되었다.
이글에서 『전경』 「교법」편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로는 『전경』이라는 경전 전체에서 교법 편의 구성이 형식상 어떠하며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아울러 「교법」이 계율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훈회를 「교법」 구절을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서의 『전경』이 증산 관련 전대 문헌과 대비해서 그 구절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에 이글은 첫 번째 목적을 찾는 방법으로 먼저 『전경』의 전체 구성을 살펴 본 후 그 안에서 「교법」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뒤에 「훈회(訓誨)」와의 상관성을 찾아보았다. 「교법」 구절을 중심으로 「훈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훈회」가 「수칙」과 함께 종교적 계율로서 제시되었는데 「교법」이 「가르침의 법(法)」으로서 『전경』의 여러 편중에서 윤리 도덕적 계율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법」 구절을 통한 「훈회」의 의미만을 살펴보고 「수칙」과의 대비된 연구는 다음에 진행하기로 한다.
두 번째 목적을 찾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전경』이 대순진리회의 소의(所依) 경전으로 문헌이며 교술(敎述) 문학이라는 면에서 접근하여 문헌학적으로 『전경』 구절의 변천을 찾아보는데 의미를 두고 전대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교법」 구절의 변이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에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전대 문헌으로는 『대순전경』 6판에서 『전경』의 「교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증산2)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을 택해 「교법」 구절과 논의하였는데 『대순전경』 6판에서 「교법」과 대비되는 장은 6장의 「법언(法言)」3) 장이 되며 이 「법언」장은 총 154절로 되어 있다. 「법언」장은 13장이었던 초판에서는 8장이었으며 총 72절이었다가 10장인 재판에서는 108절로 되었으며 총 9장으로 된 3ㆍ4ㆍ5판에서는 145절이었다가 최종적으로 6판에서 154절로 증가되었다. 이는 초기 기록인 초판 구절 수(72절)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구절(154절)이 증가된 것이며 「법언」장은 1929년 초판 이후로 37년 동안 『대순전경』의 주요 장으로 위치하며 많은 구절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증산(甑山)에 관한 문헌학적 기록에 대한 전승 차원에서의 연구사를 보면 김탁에 의해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1986)4)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임영창에 의한 「대순전경의 사적 의의」(1989)5)라는 글이 있었고, 「해원 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2003)라는 논문6)이 있었으며 양은용에 의해 「증산교의 성립과 증산천사공사기」(2006)라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7)
이와 같은 연구사를 참조하여 이글은 『전경』을 중심으로 「교법」편과 관련하여 「교법」편의 구절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교법」편의 구절을 종교적 계율의 의미를 담고 있는 대순진리회 『훈회』와 연관 지어 찾아보았다. 나아가 「교법」 내용을 대다수 포함하고 있는 『대순전경』 6판의 「법언」장과 비교해서 구절 변이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8)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전경』의 구성과 「교법」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Ⅲ장에서는 「교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훈회를 고찰해 보았다. Ⅵ장에서는 『대순전경』 6판의 「법언」장의 내용 및 특징을 찾아 본 후 Ⅴ장에서는 「교법」과 「법언」 구절에서 구절 변이의 양상 및 의미를 비교 논의 하였다.
「교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법」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는데서 더 나아가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교법」 구절을 통해 대순진리회 「훈회」를 살펴봄으로써 일면 훈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상호라는 인물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1926년 『증산천사공사기』로부터 그에 의해 1965년 발간된 완결판인 『대순전경』 6판의 내용을 선택해 『전경』(1974) 소재 「교법」 구절과의 관련성을 찾아봄으로써 「교법」 구절에 대한 문헌학적 이해를 확장하고 『대순전경』의 구절을 함께 조망하여 상제에 대한 기록의 전승사(傳承史)속에서 폭 넓은 『전경』에 대한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Ⅱ. 『전경』의 구성과 「교법」편
이 장에서는 『전경』 전체 편의 형식상 구성을 본 후 「교법」편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경』은 총 7개 편 17개 장으로 「행록」은 5장, 「공사」는 3장, 「교운」은 2장, 「교법」은 3장, 「권지」는 2장, 「제생」과 「예시」는 장의 표시는 없이 한 개의 장이 한 편을 이루고 있다.
『전경』은 크게 보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제(上帝, 1871~1909)9)의 강세(降世)로부터 화천(化天)까지의 전 생애를 요약적으로 담고 있는 「행록」편과 상제의 전 생애에서 가장 대표되는 중요한 성적(聖蹟)을 6개의 편으로 나누어 기록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중 「행록」편은 상제의 강세에서 화천까지를 전기체적으로 기록한 편으로 강씨성(姜氏姓)과 강세지(降世地)에 대한 내용이 상제의 탄강 앞부분에 먼저 등장한다. 총 5개장으로 1장은 38절, 2장은 24절, 3장은 66절, 4장은 57절, 5장은 38절로 되어 상제의 화천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행록」편 외에 6개의 편은 상제의 주요 성적(聖蹟)을 제명(題名)으로 부쳐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그 6개의 편은 순서대로 「공사」, 「교운」, 「교법」, 「권지」, 「제생」, 「예시」로 되어 있다. 이중 「공사」는 상제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행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운」은 상제의 가르침(敎)의 운세(運勢)가 어떻게 전개되었고(교운 1장) 종통(宗統)을 전수 받은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의 생애(교운 2장)에 관한 기록이다.10) 「교법」은 상제의 가르침의 법(法)이 무엇인가를 기록하였으며 「권지」는 상제가 재세(在世) 시 행한 권능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생」은 상제가 행한 치병 및 구제(救濟)에 대한 주요 내용이 등장하며 「예시」는 상제께서 미리 보여준 천지공사와 후천선경건설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경』 전체 편은 모든 구절들은 아니지만 구절들이 연도별로 배열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두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록」, 「공사」, 「교운」, 「권지」 등 4편은 전체적으로 보아 편 안에서 연도별로 되어 있지만11) 「교법」, 「제생」, 「예시」 등 3편은 몇 구절을 빼면 거의 모든 구절이 연도가 없는 구절들이다. 이상 『전경』의 구성을 표로 요약하고 「교법」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 편 | 장 | 절 | 면 | 총 면수 | 장, 절, 면 | 비고 |
|---|---|---|---|---|---|---|
| 행록 | 1 | 38 | 1-18 | 18 | 5장 223절총 96면 | 1871년12)- |
| 2 | 24 | 19-26 | 8 | 1897년- | ||
| 3 | 66 | 27-55 | 29 | 1904년- | ||
| 4 | 57 | 56-80 | 25 | 1908년- | ||
| 5 | 38 | 81-96 | 16 | 1909.1.2.-1909.6.24.(음) | ||
| 5장 | 223절 | 96면 | ||||
| 공사 | 1 | 36 | 97-112 | 16 | 3장 106절총 55면 | 1901- |
| 2 | 28 | 13-127 | 15 | 1907- | ||
| 3 | 42 | 28-151 | 24 | 1908- | ||
| 3장 | 106절 | 55면 | ||||
| 교운 | 1 | 66 | 152-189 | 38 | 2장 133절총 69면 | 1902- |
| 2 | 67 | 190-220 | 31 | 1895-1958.도주의 생애기록 | ||
| 2장 | 133절 | 69면 | ||||
| 교법 | 1 | 68 | 221-233 | 13 | 3장 173절총 41면 | 13) |
| 2 | 58 | 234-244 | 11 | |||
| 3 | 47 | 245-261 | 17 | |||
| 3장 | 173절 | 41면 | ||||
| 권지 | 1 | 33 | 262-275 | 14 | 2장 71절총 28면 | 1902-1904 |
| 2 | 38 | 276-289 | 14 | 14) | ||
| 2장 | 71절 | 28면 | ||||
| 제생 | 44 | 290-310 | 21 | 44절 21면 | 15) | |
| 예시 | 89 | 311-340 | 30 | 89절 30면 | ||
| 7편 | 17장 | 839절 | 1-340 | 340면16) | 17장 839절 총 340면 |
행록17), 공사, 교운, 권지는 추보식 기술이나 교법, 제생, 예시는 연도별 기술이 아님
『전경』의 7개 편 가운데 「교법」편은 「교운」 2장을 이어 「권지」편 앞에 있으며 네 번째 편으로, 『전경』에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을 장으로 보면 17개 장이고 『전경』의 총 구절 수는 839절인데 이중 「교법」 제 1장은 68절, 「교법」 제 2장은 58절, 「교법」 제 3장은 47절로 모두 173절이다. 이중 1장은 13면, 2장은 11면, 3장은 17면으로 총 41면인데 이 가운데 「교법」의 맨 마지막 구절인 「교법」 3장 47절은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다.
「교법(敎法)」에서 교(敎)와 법(法) 각 자의 뜻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교는 종지(宗旨)18)의 뜻이 있고 법은 도리(道理), 상(常), 모범(模範), 법도(法度), 준칙(準則), 모식(模式) 등의 뜻이 있다.19) 『전경』에서 교가 들어간 편 명(名)은 「교법」과 「교운」 두 편인데 「교법」은 「교운(敎運)」과 같이 교(敎)가 들어간 편명으로 교(敎)의 법(法), 교(敎)의 운(運)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법과 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은 무엇인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 된다. 「교법」은 상제께서 주신 가르침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제의 윤리적 도리, 모범, 법도, 준칙,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전경』의 다른 편의 구절들은 편 안에서 연도순으로 구절들이 배열되어 있으나, 「교법」 구절은 다른 편과 다르게 연도별로 구절이 배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연도는 「교법」 1장 39절(1905)과 2장 1절(1907) 및 3장 20절(1906)의 세 구절 외에는 추정하기 어렵다. 이제 타 문헌과의 대비를 위해 「교법」의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해서 표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집약해 보기로 한다. 「교법」 1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교법」 1장의 내용을 표로 요약해 보면 상제께서 주신 가르침의 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등이다.
위 네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절, 3절, 5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을 보면 37절, 38절, 40절, 41절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9절, 10절, 46절, 68절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44절(순)이다. 「교법」 2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교법」 2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상제께서 주신 가르침의 법도 「교법」 1장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이다. 다만 여기에 다섯 번째로 문헌과 관련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위 다섯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1절, 2절, 4절, 5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을 보면 10절(김병욱), 28절(김형렬), 31절(박공우), 32절(김광찬)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33절, 57절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40절, 42절, 49절, 50절, 52절 등이다. 5.문헌과 관련된 것을 보면 25절(『통감』), 26절(『서전』 서문, 『대학』), 51절(『대학』) 등이다. 「교법」 3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교법」 3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교법」 1ㆍ2장과 비교해서 두 가지 형식이 더 나타난다. 즉 1장과 2장의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5.문헌과 관련된 것’외에 3장에서는 두 가지 형식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도교 설화와 관련된 것과 한문 문장으로 된 것이다.
위 일곱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1절, 2절, 3절, 4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을 보면 10절(김병욱), 12절(박공우), 15절(차경석)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20절(최익현), 39절(정씨 건국), 40절(계룡산 건국)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28절(손빈, 제갈량), 29절(장량, 제갈량), 30절(황제, 치우) 등이다. 5.문헌과 관련된 것을 보면 32절(수운가사)이다. 6.도교 설화와 관련된 것을 보면 16절(탕자의 일), 17절(류훈장과 최풍헌)이다. 7.한문 문장과 관련된 것을 보면 47절이다. 이 한문 문장은 인정(人情),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덕(德), 천지의 기(氣), 인생(人生), 언행(言行) 등과 관련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Ⅲ. 「교법」 구절로 본 『훈회』
앞 장에서 『전경』의 형식상의 구성과 「교법」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법」의 내용에 주목하여 이장에서는 「교법」의 계율로서의 의미와 관련해서 『훈회』와 상관지어 논의해 보기로 한다. 『훈회』는 ‘1.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의 다섯 가지 항목이며 『훈회』는 종교 계율에 해당된다. Ⅱ장에서 분류한 「교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훈회』의 다섯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20)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경각(頃刻)의 안위(安危)도 마음에 있으니21) 성인의 마음을 본 받아 수행을 해나가는 것22)이 요구된다. 또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내용은 탐하는 마음에 대한 경계23)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24)는 상제의 말씀이 있기도 하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은 먼저 상제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25)이며 비유로서 성냥갑을 다 쓰고 그것을 빈 것으로 드러내 버리는 것26)이라는 내용과 함께 노름죄가 큰 이유가 타인을 속이는데 있기 때문27)이라는 예도 나타난다. 이에 상제는 수운이 도기(道氣)를 말한 내용과 다르게 진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복을 이르게 하는 첩경임28)을 강조하셨으니 이는 마음을 속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복으로의 보상에 기인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이에 복을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운수가 진실을 지키고 사곡을 버림에 있음을 상제께서는 강조한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29)
인간은 욕망을 채워야 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인데 욕망을 위해 사곡에 빠질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자유의사로 욕망을 채운다 하더라도 필요한 덕목은 마음을 바로 해서 진실에 토대해야 됨을 천명한 것은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무자기(無自欺)의 강조 그것이다. 이에 진실은 각자의 운수를 결정하는 근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언덕을 잘 가지라」30)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김 갑칠이 항상 응석하여 고집을 부리나 상제께서 잘 달래여 웃으실 뿐이고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시니 그는 더욱 심하여 고치지 않는도다. 형렬이 참지 못해 「저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으니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의 언행이 아직 덜 풀려 독기가 있느니라. 악장제거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惡將除去無非草 好取看來總是花)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31)
종도와의 일화 속에서 상제께서는 김갑칠에 대해 독기를 품고 말하는 김형렬에게 「好取看來總是花」를 들어 말의 덕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언덕을 잘 가지는 것이 복을 이루게 되는 초석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고조의 마상(馬上) 득천하(得天下)가 아닌 좌상(座上) 득천하(得天下)32)가 이루어지는데 전술과 병기 및 술수가 아님과 오직 언덕을 잘 가지는 것33)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언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뱀이 용이 되는 것도 사람의 언덕에 따른 인망에 있다는 비유를 들며 남의 말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34) 또 상제께서는 사람마다 자기 노릇을 하는 것이므로 시비를 말하지 말아야하며35) 남의 누행을 말하는 것도 경계하였다.36) 아울러 한가로이 나누는 이야기라도 풍진(風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니37) 입을 곤륜산처럼 무겁게 간직하라38)고 교훈하였다.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척을 짓지 말라」39)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척과 관련된 구절은 조선조 사회적 현실과 연관되어 원한이나 해원을 말한 내용40)과 연계되어 언급되고 있다. 척은 남의 호의를 저버리는 것에서도 생겨41) 그 심각성은 일인(一人)의 원한일지라도 천지의 기운을 막을 수 있으니42) 원수를 은인과 같이 사랑해야하며43)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다44)고 하였다. 따라서 김형렬45)과 박공우46) 및 차경석47)이 상대를 해하고자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돌려 원심을 풀라하고 상제는 복마(伏魔)의 발동을 이기라하였으며48) 다시 남을 미워한다거나 원한을 맺어서는 안된다49)고 하였다. 아울러 척을 없애는 일에는 인간계 자손만이 아닌 신계 조상들까지도 연관되어 있다50)하였으며 역신(逆神)의 해원51)을 하기도 하였다.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52)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법」에서 은혜에 관한 내용은 대순진리회 요람의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설명한 부분인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先) 보본(報本)의 대의(大義)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敎) 포덕(布德)으로써 제도(弟道)를 다하라」고 한 설명에서 효도를 다하고 제도(弟道)를 다하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부모에 대한 불경을 경계한 부분53)에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 유추할 수 있고 스승에 대한 배사율54)을 언급한 부분에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면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는 한고조(漢高祖)와 한신(韓信) 사이의 역사적 일화를 들어 은혜에 대해 평가하기도 하였고55) 당시 전봉준의 거사(擧事)로 있게 된 사회 개혁에 의한 약자들에 대한 지배층의 착취로부터 인권해방을 가져다준 준 은혜를 종도에게 깨우쳐주기도 하였다.56)
「교법」 구절 가운데 훈회의 「남을 잘 되게 하라」57)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는 남을 잘 되게 해 준 일로 전봉준의 거사를 언급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58)
상제께서 교훈하신 중요한 덕목이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원한과 척이 많은 소외 계층인 상놈과 천인을 잘 되게 해 주려했던 전봉준의 거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종도들에게도 타인과 다투고 천인을 천대하거나 불의함을 행하지 말라하였으며59) 천하 사람을 위하려는 기국(器局)을 가지라하고60) 덕을 닦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하였다.61)
Ⅳ. 「교법」에 없는 『대순전경』 6판 「법언」 구절 분석
앞 장에서 계율인 훈회를 「교법」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았다. 이제 이장에서는 『전경』 「교법」 구절과 형식과 내용이 유사한 구절과의 비교 연구를 한다는 면에서 그 변이를 『전경』 보다 먼저 발간된 문헌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전경』(1974)에 앞 서 1965년 발간되어 증산 교단에서 보편화된 『대순전경』 6판을 보기로 한다.62) 『전경』의 「교법」편에 대비되는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대순전경』 6판에서는 「법언(法言)」장이 된다. 「법언」장은 『대순전경』 6판의 9개의 장 중 순서상 여섯 번째 장이며 총 154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 「법언」장의 내용을 『전경』 「교법」편을 요약한 것과 같이 표로 정리한 후 몇 가지로 집약해 보기로 한다.
위의 「법언」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법언」 즉 ‘법이 되는 말씀’도 그 내용을 「교법」에서 분류했던 것과 같이 7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1.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5.문헌과 관련된 것, 6.도가 설화, 7.한문 구절이다.
「교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116절로 위 다섯 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개의 예가 되는 구절을 보기로 한다. 그것은 1. 상제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으로 1절, 2절, 3절, 5절 등 다수가 있다. 2.상제께서 종도와 관련해서 「법언」을 한 것을 보면 7절(차경석), 20절(박공우), 23절(유찬명) 등이다.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29절(전봉준), 116절(전명숙), 126절(의병) 등이다.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68절(정북창), 83절(삼국지) 등이다. 5.문헌과 관련된 것을 보면 32절(통감), 143절(대학) 등이다. 이 다섯 가지 외에 『전경』 「교법」편 3장에 등장했던 도가(道家) 설화와 문미에 첨부된 한문 문장을 「법언」에서 찾아보면 도교 설화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한문문장과 관련해서 몇 개의 구절이 구절들 사이에 삽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64)
이상 「법언」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다음으로 「교법」과 비교해서 「법언」장에만 수록된 다른 구절들65)을 보기로 한다.66) 『대순전경』 6판 「법언」67)편과 비교해서 『전경』의 「교법」편의 많은 구절들이 같은 내용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모두 같지는 않고 「교법」과 「법언」이 각각 서로 다른 구절도 수록하고 있다. 「법언」장의 구절은 154구절로 「교법」의 173구절 수 보다 19구절이 적은데, 이중 「교법」편에는 등장하지 않는 「법언」의 구절을 「교법」의 내용 비교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68)
이상의 「법언」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종도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척이나 해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여성 해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난다.(41, 44, 46, 47, 134, 135절) 또 유교에 의한 인습(因習)(7절)과 허식(虛飾)(8절)에 대한 비판, 덕(24절)과 보은(40, 70절)의 강조, 인물(전봉준)의 공에 대한 평가(116, 118절), 수운가사의 인용(133, 145절), 한문구절(110, 140절) 그리고 수심과 실천 수행의 강조(53, 65, 89, 103, 104, 109, 154절), 일본에 대한 평가(126, 129.132절) 이외에 중국(132절), 하늘의 작용(140절), 선령신(先靈神)(142절), 생식과 벽곡(137절) 등에 관한 것 들이 있다.
Ⅴ. 「교법」의 「법언」과의 변이 비교
1974년 간행된 『전경』의 구절들과 관련 형식 및 내용상 변이를 보이는 구절을 1965년 출판된 『대순전경』 6판과 비교해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증산 교단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순전경』 6판(1965)에서 「교법」과 같은 의미로 위치하고 있는 「법언」장과 비교해서 그 내용상 변이를 보이는 구절들을 선별해서 그 양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전경』 구절의 변천 및 전대 문헌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두 문헌의 「교법」과 「법언」을 비교해서 「교법」에서 13개 구절이 나타난다.
「교법」편 1장에서는 25절, 28절, 35절, 38절의 네 구절을 보기로 한다.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70)
이 구절은 「법언」 26절에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느니라’고만 되어 있다. 『전경』에 와서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는 구절이 더 첨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첨부된 부분은 「법언」 27절에 있는‘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는 구절이었는데 『전경』에서 하나의 구절로 합쳐졌음을 알 수 있다. 앞 부분과 새로 첨부된 뒷 부분이 주종적(主從的) 의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비교적 짧은 두 개의 구절이 한 구절로 축약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8절을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람도 불다가 그치나니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 동정에 때가 있나니 걷힐 때에는 흔적도 없이 걷히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71)
이 구절은 「법언」 19절에 있는 “풍역취이식하나니 남의 박해(迫害)에 굽히지 말라 만사 동정이 각기 때가 있느니라”는 구절보다 박해에 대한 의미가 상세히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구설을 사서 분개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난다. 아울러 남의 시비를 잘 이기라는 말과 함께 시비가 없어질 때는 흔적 없이 걷힌다는 강한 교훈적 의미가 「교법」에 더 잘 표현되어 있다. 다음으로 35절을 보기로 한다.
동학가사에 「운수는 길어가고 조같은 잠시로다」 하였으니 잘 기억하여 두라.72)
이 구절은 「법언」 146절에 “수운가사에 「운수는 가까워오고 조같(기회機會)은 잠시로다」 하였나니 도에 뜻하는 자의 거울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수운 최제우의 가사집에 기록된 내용을 ‘운수는 길어가고’라고 정정(訂正)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같에 대한 뜻이 기회(機會)라고 하였으나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도에 뜻하는 자의 거울이니라는 수운가사 글귀에 대한 평가는 ‘잘 기억하여 두라’는 순화된 의미로 정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8절을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 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73)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16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성에게 일러 가라사대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치 말며 남의 보배를 탐내지 말며 남과 서로 싸우지 말며 도한(盜汗)과 무당(巫堂)에게 천하게 대우하지말라74)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 6판에 있던 도한(屠漢)과 무당(巫堂)에게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부분이 탈락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전경』에서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 된다. 도한과 무당이라는 부분이 천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도한과 무당을 구체적으로 가리켰던 면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전경』에는 이어서 안내성에게 한 교훈으로서 뒤에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패자가 들어 있느니라’는 내용이 더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편 9절에 ‘보화라는 글자에 낭패라는 패자가 붙어 있느니라’는 내용이 결합된 것인데 안내성에게 교훈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전경』에는 안내성에게 교훈한 것으로 통합되어 있다. 1장에 이어 다음으로 「교법」 2장을 보기로 한다.
「교법」 2장에서는 12절, 15절, 20절, 51절, 56절의 다섯 개 구절을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항상 도술을 배우기를 원하니 지금 가르쳐 주어도 그것은 바위에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 쓸지니라」 하셨도다.75)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82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도술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 가라사대 이제 가르쳐 주어도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 바위에 물주기와 같으리니 쓸 때에 열어주리라 하시니라76)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에 어떤 사람이 도술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니라고 하여 한 개인이 도술을 배우고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경』에서는 상제가 도술을 배우고자하는 여러 종도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쓰라는 심성(心性)을 수행하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첨부되었다. 다음으로 15절을 보기로 한다.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77)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37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마로 위주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78)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에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는 내용이 ‘해원하리라’는 내용으로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복을 받는다는 일상적 의미가 원(冤)을 푼다는 좀 더 구체적이며 교리와 가까운 뜻으로 확장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정낙언(鄭樂彦)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최익현의 만장을 다음과 같이 지으셨도다. 讀書崔益鉉 義氣束劒戟 十月對馬島 曳曳山河橇79)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法言)」 94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잡히거늘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환 속에서 정시해는 죽었으되 최익현은 살았으니 이는 일심의 힘으로 인하여 탄환이 범하지 못함이라 일심을 가진 자는 한 손가락을 퉁겨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깨뜨리느니라 하시니라.80)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에 없던 최익현의 만장(輓章)이 『전경』 「교법」편에는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 만장은 『대순전경』 6판에서는 「천지공사」 20절 부분에 있는 내용이나 『전경』에 와서는 최익현의 일심 관련 기록과 하나가 되어 합쳐진 것이 된다. 최익현의 살아서의 일심(一心)의 행적과 사후에 지은 만장이 하나로 되었는데 만장의 내용을 보면 도학자였던 최익현이 의기(義氣)로 의병을 일으켰으나 애석하게도 대마도에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만장 앞 내용과 상관지어 보면 만장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의 의병을 일으킨 부분은 그의 일심과 내용상 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장의 세, 네 번째 구절은 앞과 다르게 면암이 유배되어 죽은 사실을 언급해 만장의 의미와 통하고 있다.
그런데 『대순전경』 6판에서 만장이 있던 4장 「천지공사」 20절은 만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장의 앞 부분에 최익현의 거사에 대한 내용이 함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사 비를 많이 내리신 뒤에 만경을 떠나 익산 만성리로 가시며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번에 최 익현의 동함으로 인하여 천지신명이 크게 동하였나니 이는 그 혈성에 감동된 까닭이라 그러나 그 재질이 대사를 감당치 못할 것이요 한갓 생민만 사멸에 몰아들일 따름이라 아무리 구호하여도 무익의 일이요 더욱이 한해(旱害)를 물리치지 아니하여 기근(饑饉)이 겸지하면 생민을 구활할 방책이 전무하리니 실로 양전(兩全)키 불능한 바라 어찌 한스럽지 아니 하리요 하시며 그의 만사를 지어 종도들에게 외워 주시니 이러하니라.
讀書崔益鉉 義氣束劒戟 十月對馬島 曳曳山河橇81)
위에서 만사의 앞부분은 최익현의 순창에서의 의병 거사가 천지신명이 동한 것이나 성공하기 어렵고 한재가 또한 겹쳐 생민들이 기근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한스럽다는 것이다.82) 이에 비를 흡족히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사를 지은 것은 최익현의 죽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최익현의 만장에 주목할 때 『대순전경』 6판에서는 만사 앞에 상제께서 한재(旱災)에 비를 내린 이적(異蹟)으로 생민을 구제한 공사와 최익현의 거사가 천지신명을 크게 움직이기는 했으나 최익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언급과 함께 최익현의 죽음에 대한 만사가 공사로서 연계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경』에서는 최익현의 죽음이 아닌 그의 일심을 교훈적으로 강조하고 만사를 지어 줌으로서 죽음의 의미 속에서도 그의 일심을 기리는 긍정적 기록으로 만사가 전승 정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만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글로 망자(亡者)에 대한 생애를 애도하고 평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며 만사가 여타 내용과 결합될 때 그것이 긍정적 요소냐 부정적 요소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전경』의 기록에서 만사가 최익현이라는 인물의 부정적 요소와 결합되기보다는 긍정적 요소와 결합되어야 그에 대한 상제의 평가와 맞게 된다는 면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51절을 보기로 한다.
「교법」 3장에서는 2절, 29절, 31절, 33절의 네 구절을 보기로 한다.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87)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99절과 대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간에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88)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 6판에 있던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는 부분이 『전경』에서는 탈락되었음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탈락된 부분은 『전경』의 다른 편을 보았을 때 다시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대순전경』 6판의 내용이 『전경』에서 탈락된 면을 읽을 수 있다.다음으로 29절을 보기로 한다.
천지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하나니 공명지정대(孔明之正大)와 자방지종용(子房之從容)을 본 받으라.89)
위의 구절은 『대순전경』 6판 6장 「법언」 94절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찬이 천지개벽의 더딤을 불평하여 매양 좌석을 분요케 하거늘 천사 일러 가라사대 모든 일이 욕속부달이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유치(幼稚)를 면하라. 사지종용(事之從容)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사지분란(事之紛亂)도 자아유지라 자방지종용(子房之從容)과 공명지정대(孔明之正大)를 본받아 유치(幼稚)를 면하라 하시니라90)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대순전경』 6판에는 ‘광찬이 천지개벽의 더딤을 불평하여 매양 좌석을 분요(紛擾)케 하거늘 천사 일러 가라사대 모든 일이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마음을 평안케 하여 유치(幼稚)를 면하라’는 내용이 앞 부분에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종도 김광찬이 개벽을 빨리 해달라는 불평에 대해 욕속부달의 교훈을 해준 것이다. 그리고 이 일화와 관련해서 장량과 제갈공명의 인물됨을 평가하며 계속적으로 한문 구절로 김광찬을 깨우쳐 준 이야기가 된다. 한문 구절만을 통한 교훈이 아니었음을 『대순전경』 6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전경』에 와서는 특정인에게 한정된 교훈만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1절과 33절을 함께 보기로 한다.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91)
위징(魏徵)은 밤이면 옥경에 올라가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태종(唐太宗)을 섬겼다 하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뺐다 넣었다 하리라.92)
위의 두 구절은 『대순전경』 6판에서는 「법언」 76절로서 「교법」 31절과 33절의 순서대로 한 구절이었음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찰지리(下察地理)는 있었으나 중통인의(中通人義)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人義)를 통하였노라. 위징(魏徵)은 밤이면 옥경에 올라가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 태종(唐太宗)을 도왔다하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찔렀다 하노라.93)
두 경전의 내용을 보면 하찰지리였던 구절이 하달지리로, 중통인의 였던 구절이 중찰인의로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법언」에서는 상제께서 인의를 통하였다고 하였으나 「교법」에서는 ‘이제 나오리라’라고 하여 일반적 의미로 되어 있다. 「교법」 31절은 중찰인의의 뜻이고 33절은 위징의 신화적 행적을 예로 들어 상제의 권능을 말한 의미로 서로 다른 면을 볼 때 『전경』에 와서 『대순전경』 6판 「법언」의 구절이 나누어져서 내용상 두 구절로 독립된 변이가 나타난 것이 된다. 이상에서 「교법」의 총 13개 구절을 통해 전대 문헌인 『대순전경』 6판과의 형식 및 내용상 전승의 변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표를 보면 전대 문헌인 『대순전경』 6판 「법언」과 비교해서 『전경』 「교법」에서는 구절의 형식면에서는 다수의 구절에서 새 구절이 더 추가됨을 볼 수 있다. 두 구절이 합쳐지기도 하고(1장 25절) 인용문헌 구절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으며(1장 35절), 다른 구절에 있던 동일 인물에 대한 구절이 첨부되기도 하였음(2장 20절)을 볼 수 있다. 또 일부 구절이 탈락되기도 하였다.(3장 2절)
전체적으로 보아 내용상으로는 『대순전경』에 비해 『전경』에서는 마음의 수도와 실행과 관련된 구절이 추가되며 실천 수행이 부각되고 있으며, 시비를 잘 이기라는 것과 해원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Ⅵ. 결어
『전경』은 「행록」, 「공사」, 「교운」, 「교법」, 「권지」, 「제생」, 「예시」 등 일곱 개 편으로 되어 있으며 『전경』을 장으로 보면 17개 장이 된다. 『대순전경』 6판에서 「교법」과 대비될 수 있는 장은 6장의 「법언」장이 되는데 「법언」장은 총 154절로 되어 있다. 「법언」장은 13장이었던 초판에서는 8장 72절이었다가 10장인 재판에서는 8장 108절로 되었으며 9장인 3,4,5판에서는 145절이었다가 최종적으로 6판에서 154절로 증가되었다.
「행록」을 제외하면 구절 수에 있어서는 「교법」이 173절(41면)로 가장 많으며 면수에 있어서는 「교운」편이 69면(133절)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교운」 2장이 도주(道主)에 관한 내용인 것을 생각하면 면수에 있어서는 「공사」편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제에 관한 기록에 있어 기록의 양에 있어서는 「공사」가 구절 수를 보았을 때에는 다양한 소재에 있어서는 「교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공사」는 상제의 차별화된 종교적 행적으로 강조되었고 「교법」은 교훈적인 요소로 중요함을 볼 수 있다.
「교법」은 「교운」과 같이 교(敎)가 들어간 편명으로 교의 법(法), 교의 운(運)으로 볼 수 있다. 「교법」은 가르침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무엇인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 된다. 종교적으로 보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증산의 윤리적 규범이 된다.
「교법」의 내용은 1ㆍ2장은 1.상제가 직접적으로 말한 것, 2.상제가 종도와 관련해서 「교법」을 준 것, 3.조선후기 사회적 현실과 관련된 것, 4.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고사와 관련된 것, 5.문헌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3장에서는 두 가지 형식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도교 설화와 관련된 것과 한문으로만 된 문장이다.
『대순전경』 6판 「법언(法言)」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종도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척이나 해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여성 해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난다. 또 유교에 의한 인습(因習)과 허식(虛飾)에 대한 비판, 덕과 보은의 강조, 인물의 공에 대한 평가, 수운가사의 인용, 한문구절 그리고 수심(修心)과 실천 수행의 강조, 일본에 대한 평가 이외에 중국, 하늘의 작용, 선령신(先靈神), 생식(生食)과 벽곡(辟穀) 등에 관한 것 들이 있다.
「법언」장을 표로 요약해 보면 「법언」 즉 ‘법이 되는 말씀’도 「교법」에서 분류했던 것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965년 발간된 전대 문헌인 『대순전경』 6판 「법언」과 비교해서 「교법」에서는 구절의 형식면에서는 다수의 구절에서 새 구절이 더 추가됨을 볼 수 있다. 두 구절이 합쳐지기도 하고 인용문헌 구절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구절에 있던 동일 인물에 대한 구절이 첨부되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 일부 구절이 탈락되기도 하였다. 내용상으로는 『대순전경』 6판에 비해 『전경』에서 마음의 수도와 실행(實行)과 관련된 구절이 추가되고 실천 수행이 부각되었으며, 시비를 잘 이기라는 것과 해원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