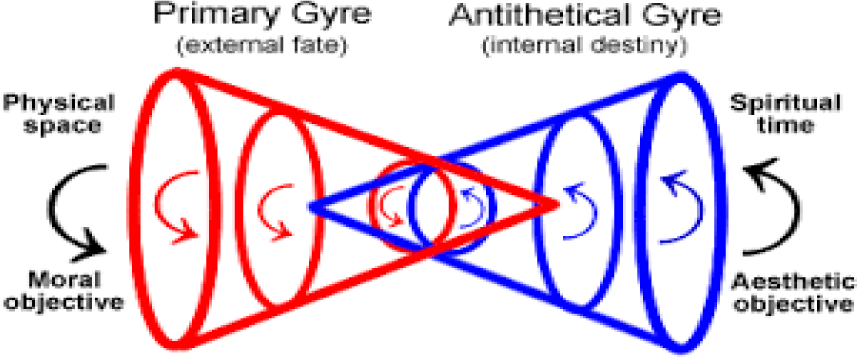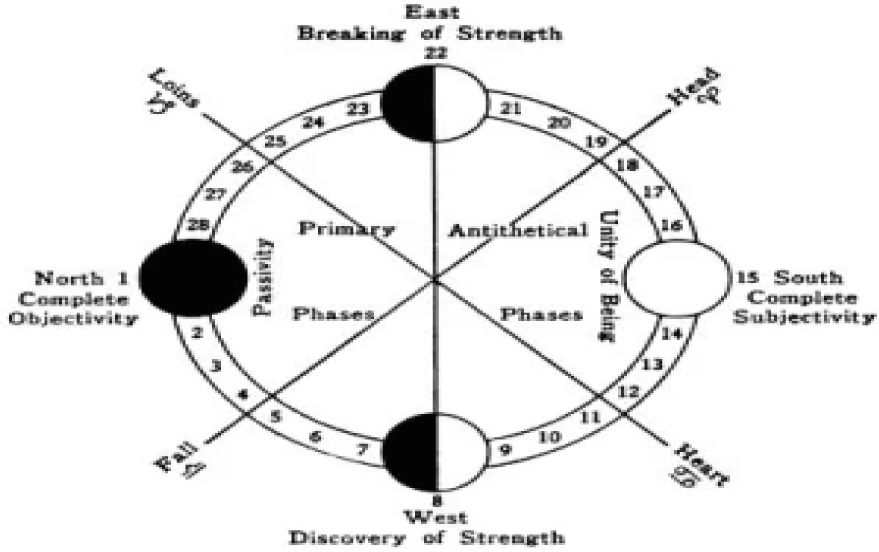I. 서론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의 관점으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1865~1939)의 희곡 작품을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제 연구이다. 학제 연구의 이점 중의 하나는 이질적인 분야에서 가져온 개념이나 예시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순기능을 기대한다. 하지만 해원상생과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통섭한 김석이 종교적 담론인 해원상생과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적 이론과의 비교 연구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1) 예이츠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해원상생과 예이츠의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그 영역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유사점보다는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없는 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찾기 어렵고 그 통섭의 결과의 효용성까지 생각한다면 그 연구가 매우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이질적인 영역이 통섭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적어도 김석이 말한 ‘상보적 대화’가 가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산출된 결과물이지만 서로 대칭되어 좀 더 깊은 토론이 가능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이츠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20세기 전반, 그리고 아일랜드의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을 위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한 작가로 이원론에 치우친 사상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망으로 이원론의 두 반대되는 힘이 조화되는 상태인 ‘존재의 통합’(Unity of Being)2)을 추구하였다. 대순사상은 인세에 강세한 증산3)(1871~1909)이 19세기 구한말 급격한 사회 변혁기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던 민생을 구원하기 위해 내놓은 사상이었지만4) 당시의 세태를 좀 더 우주적인 차원에서 진단하고 파멸로부터 세계의 민생을 구해낼 방책으로 해원상생을 제시하였다.5) 이러한 두 영역의 접점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서양 작가이면서 동양의 영적 세계와 아일랜드의 정령신앙에 대한 관심이 집약된 예이츠의 저서 『환상록』(A Vision)을 통해서 그의 ‘존재의 통합’이란 사상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다음 단계로 예이츠가 서양의 이원론의 한계를 알고 대립하는 두 가지 양상의 투쟁에 의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인 ‘존재의 통합’이 대순사상의 음양합덕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음양합덕의 상태는 음양의 주재자에 의한 해원상생의 법리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두 영역에 대한 통섭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이츠의 희곡 『유골의 꿈』(The Dreaming of the Bones)을 재해석해서 예이츠란 예술가가 겪었던 상극이 지배된 세상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갈등과 분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 과정에서 『전경』에서 선천의 원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단주의 원을 통해서 원의 관점에서 희곡 작품의 등장인물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Ⅱ. 이원론에서 존재의 통합으로
예이츠는 낭만주의 시대와 모더니즘 시대를 걸치는 긴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이고 1923년에는 아일랜드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평생 영적 세계의 탐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887년에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6)의 기원이라고 하는 ‘신지학 협회’(theosophy)에 가입을 하였고, 1890년에는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신비단체인 ‘황금여명회’(Hermetic Order of the Golden Dawn)의 회원이 되었다. 또한 예이츠는 우파니샤드와 일본의 ‘노’(Noh)극을 통해서 선불교를 수용하여 사후 영혼의 세계에 대한 지식도 탐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의 동시대인 빅토리아시대에 물질만능주의와 이성주의가 가져온 과학주의, 실증주의 철학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주류를 이루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에 반대하며 신플라톤주의 철학 같은 신비사상에 몰입하였다. 하지만 예이츠가 가진 사상의 근본에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아일랜드의 요정과 영웅에 관한 정령 신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이츠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시기에 영국과는 다른 아일랜드 고유의 정신문화였기 때문이다.
예이츠의 신비철학이라고 불리는 그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는 그의 저서 『환상록』에 잘 담겨 있다. 이 저서는 1925년에 처음 출판된 후에 12년에 걸쳐 체제와 내용을 전면 수정한 개정판을 1937년에 출판하기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된 노작이다.7) 예이츠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세상 만물이 주관과 객관,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이 ‘투쟁’(strife)8)에 의해 통합되고 발전해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 ‘객관성’(Objectivity)과 ‘주관성’(Subjec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로 상반되는 힘을 표현하고 이 힘들이 나선형 소용돌이 모양인 ‘가이어’(Gyre)의 형태로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림 1>9)에서 보듯이 한쪽 가이어가 강해지면 다른 가이어는 약해지고 한쪽 가이어가 약해지면 다른 가이어는 강해지는 상반적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용어는 ‘주조적’(Primary)과 ‘반대적’(Antithetical)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 있는데 ‘반대적’ 힘은 ‘감정적이고 미학적’(emotional and aesthetic)인 양상을 나타내고, ‘주조적’ 힘은 ‘이성적이고 도덕적’(reasonable and moral) 양상을 상징한다. 이 대립되는 두 힘의 생성과 쇠퇴의 주기를 ‘거대한 수레바퀴’(Great Wheel)라는 도형으로 표현하고, 이 바퀴의 회전을 달의 변화과정에 비유해서 ‘달의 28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래 <그림 2>10)에서 보듯이 ‘15상’(Phase15)을 ‘완전한 주관’(Complete Subjectivity)이라 부르고 이 상태를 ‘존재의 통합’이라 이름하였다.11)
‘15상’이 ‘이상적 혹은 초자연적 환생’(an ideal or supernatural incarnation)으로 인간적인 환생이 아닌 것처럼 ‘1상’(Phase1)도 이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를 예이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상과 15상은 인간의 환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색깔(힘)들 간의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hase 1 and Phase 15 are not a human incarnation, because human life is impossible without strife between the tinctures.12)
1상과 15상 모두 인간의 환생이 아니지만 ‘완전한 주관성’인 ‘15상’을 ‘존재의 통합’이라 명하는 것을 볼 때 예이츠가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에 더 많은 강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도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느 한 성질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실용적 객관성만이 높게 평가되는 사회에서 무시되기 쉬운 주관성에도 동일한 관심을 두어서 한 인간을 또는 한 사건을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예술가로서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양의 이원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한 예이츠의 사상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학선은 ‘거대한 수레바퀴’가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담고 있는 동양의 태극문양과 흡사하고 나선형으로 넓어지면서 회전하는 가이어와 또 하나의 상반된 방향으로 회전하여 오는 두 개의 가이어는 태극 속의 음양의 움직임과 비슷하여 ‘달의 28상’이 움직이는 길은 음양오행에서 인간 세계의 다섯 개의 원소가 움직이는 길인 오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 그러므로 예이츠는 서양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양적 사고를 수용하여 서로 모순, 상반되는 요소들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룬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그 조화의 세계가 그가 평생에 걸쳐 추구한 ‘존재의 통합’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예이츠의 ‘존재의 통합’은 아일랜드의 신화와 전설, 민담을 다룬 예이츠의 산문집인 『켈트의 여명』(The Celtic Twilight, 1893)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정연욱도 『켈트의 여명』의 중심사상이 이원론적인 상황에서 투쟁과 갈등이란 처절하고도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일원론에 이르는 통합이라고 주장한다.14) 특히 예이츠가 ‘황혼’으로 상징하는 “옳고 그름의 그물을 벗어버리고” 통합적 사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의 배경에는 그의 동시대에 대립하는 두 요소를 통합시키려는 그의 간절함이 있었다. 예이츠는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이성주의가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켈트 민족의 범신론을 가져와서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이 통합을 이루도록 하여 당시에 아일랜드를 분열시키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간격을 제거해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이츠의 통합사상은 그의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대한 입장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의 주체성을 회복하기를 희망하였지만 동시에 완고하며 패쇄적인 민족주의는 경계하는 초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었다.15) 다시 말하면 최윤주가 주장하듯이 예이츠가 “다양한 정치적 논쟁과 움직임 사이에서 조화된 ‘존재의 통합’을 이루고 유지하고자”하였다고 할 수 있다.16)
요약하면 예이츠의 ‘존재의 통합’은 그의 작품세계를 위한 심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동시대에 만연하던 여러 가지 대립하는 요소들을 통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윤일환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족과 문화의 통합을 이루려는 예이츠의 노력과 비례해서 이를 방해하는 “아일랜드의 종교, 계층, 언어가 서로 갈등하는 공간”이 부각되어 드러나게 되었지만17) 예이츠는 평생에 걸쳐 ‘존재의 통합’에 이르고자 하였다. 이러한 ‘존재의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길로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해원상생의 법리를 ‘존재의 통합’과 연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Ⅲ. 해원상생을 통한 음양합덕
음양사상은 자연의 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대순사상18)도 동일한 우주관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대순사상의 독특함은 음양 두 기(氣)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음양 두 기의 불균형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의 음양 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음양합덕 원리에 관한 탐구를 통하여 동서양 사상의 영향으로 만들어 낸 예이츠의 사상이 담고 있는 원리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순진리회 종지(宗旨)의 첫 번째 대목이 음양합덕이라는 점에서 대순사상의 근간이 음양합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19) 『전경』의 교운 2장 42절의 「음양경」(陰陽經)에서 음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성공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 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성공한다.20)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21)
위의 인용문은 천지의 운행과 만물의 이치가 모두 음양의 관계 속에서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음양은 상반된 관계이지만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이 서로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서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내포한다. 고남식도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적인 원리로 현상계와 물질계를 설명할 때 음양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상대적 가치를 갖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음양이 ‘상호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2) 이러한 관점이 예이츠의 동시대인들이 물질문명에 치우쳐서 양적 요소에만 주목하는 것과 다른 관점이고 두 대립적 요소가 원뿔의 형태로 서로 맞물려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예이츠의 시각과 유사한 지점이다.
음과 양의 ‘상호 불가분의 연관성’은 양인 인간과 음인 신의 관계에까지 적용되는데 「음양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늘은 땅의 감화가 없으면 하늘 아래로 펼 수 없고 땅은 하늘의 공력이 없으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다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23)
天無地化無布於其下地無天功無成於其上天地和而萬物暢天地安而萬象具 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竢人人竢神明24)
물질문명만을 주목하는 세계에서는 거론될 수 없는 신의 세계도 음양의 ‘상호 불가분의 연관성’을 인식한 우주관에서는 당연히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는 대상이다. 위의 인용문은 신과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이끌어 주는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신과 인간의 조화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대순진리회 두 번째 종지인 신인조화(神人調化)로 연결된다.
음양의 유동적 관계를 『전경』의 제생 4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남식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모든 일은 시발하는 곳을 관찰해야 하며 음과 양에 있어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밝아진다. 또한 음에서 일을 일으키면 양으로 나타나고 양으로 드러나면 음은 숨는다. 이것이 음이 쇄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쇄하면 음이 생하는 이치와 같다. 곧 생쇄의 도가 음양에 있다.25)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26)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한 음양의 상호 관계는 예이츠가 그의 가이어로 가시화하려고 한 것과 같은 원리를 보강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과 ‘주관성’이라고 지칭한 두 개의 상반되는 힘들은 음과 양의 다른 이름이고 이 두 개의 힘이 두 개의 나선형 소용돌이 모양인 ‘가이어’들로 서로 맞물려서 한쪽 가이어가 강해지면 다른 가이어는 약해지고 한쪽 가이어가 약해지면 다른 가이어는 강해진다고 설명한 것이 음양의 ‘생쇄’와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이츠가 그의 동시대의 현상에 반발한 것도 음양의 ‘상호불가분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이성에만 입각한 과학이나 물질주의, 합리주의, 객관주의, 산업주의가 만들어 낸 불균형에 대한 것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예이츠가 인지한 물질문명에 치우친 문명의 병폐를 『전경』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 .27)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음양적 관계에서 당연히 ‘상호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게 됨에 따라 음양의 불균형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음으로서의 신의 세계의 권위가 떨어졌으며 이로써 신계와 인간계간의 음양조화의 상도가 무너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남식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의 음양 상대 관계로 유지되어온 선천 자체의 질서를 파괴”하게 된 것이다.28)
앞에서 인용한 전경 구절처럼 모든 일이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펼쳐져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양적 세계에만 치우치게 됨으로써 서양문명의 파멸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간과되었던 음의 세계인 신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음양이 부조화된 천지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전경』의 공사 1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 .29)
음양이 상극적으로 대립하면서 발생한 원한을 풀어야 조화로운 상생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의 시작은 모든 일을 ‘신도’로부터 원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음의 원을 풀어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 대순사상 종지의 세 번째인 해원상생(解免相生)이다. 그리고 이것이 대순사상이 다른 사상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해원상생에서 해원을 한다는 것은 음의 원을 풀어 음양이 상극에서 벗어나 정음(正陰)과 정양(正陽)이 되어 합덕이 되고30) 그 결과로 인류가 소망하는 이상세계가 가능하고 그 세계가 대순사상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후천선경’이고 대순진리회 종지의 마지막 대목인 도통진경(道通眞境)인 것이다.31)
음양이 서로 생하는 상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이 갖는 가장 큰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원상생의 ‘상생’은 오행(五行)의 상생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배규한은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설명한다.
오행의 상생은 모든 사물들을 다섯 가지 요소 또는 이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다 같이 상생의 원리를 적용하는 ‘우주론적인 상생’이고 목(나무)ㆍ화(불)ㆍ토(흙)ㆍ금(쇠)ㆍ수(물)가 차례차례로 다음 것을 생한다는 뜻에서 ‘일방적인 상생’일 뿐이다.32)
오행의 상생이 ‘우주론적 상생’으로 ‘일방적인 상생’인 것과 달리 해원상생의 상생은 ‘서로 살려주고, 서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양방향 상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원상생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원상생의 주재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배규한은 『전경』을 근거로 그 주재자가 인신(人身)으로는 증산 성사이고 원위(原位)로는 구천상제임을 밝히고33) 박인규는 “지고신이자 하느님”34)이라고 지칭하였고, ‘최고신’과 ‘무극신’35)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차선근은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밝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를 “가장 높은 하늘인 구천에서 절대자가 음양의 결합인 뇌성으로써 하늘과 땅의 기를 오르내리게 하여 만물을 생성ㆍ변화ㆍ지배ㆍ자양한다는 의미를 담은 존칭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36) 따라서 해원상생의 주재자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음양의 부조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절대자인 ‘상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전경』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상제께서 을사(乙巳)년 봄 어느 날 문 공신에게 “강 태공(姜太公)은 七十二둔을 하고 음양둔을 못하였으나 나는 음양둔까지 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37)
위 전경 구절에서 해원상생의 주재자로서 ‘구천상제’의 권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 ‘음양둔’을 『전경용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음양둔을 한다’라는 동사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음과 양으로써 조화를 부리는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음양둔의 둔(遁)이 둔갑(遁甲)에서 나온 말로서 곧 도술이나 조화를 부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인 음양으로써 조화를 부리기 위해서는 음양의 주재자(主宰者)라야만 한다.38)
위의 설명처럼 ‘음양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음양의 부조화를 조화로 이끄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의 주재자의 원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원의 시작이 되는 원을 푸는 것이다. 『전경』에서는 인류 역사의 원의 시작을 단주의 원으로 보고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39)
이 전경 구절에 대한 학문적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40) 중요한 것은 인류역사의 원의 시작을 해원시킴으로써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한 원의 의미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응어리진 마음인 원한(怨恨)”뿐만 아니라 원(冤)이라는 표의문자가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토끼의 심적 고통과 원망”을 나타내주는 것처럼 “인간 욕구-욕망의 미충족에 의한 원한”도 포함하고 있다.41)
폭넓은 개념의 원을 풀어서 상생하는 해원상생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유사한 사상과의 비교가 유용할 수 있다. 차선근은 중국초기민간도교의 기본 경전인 『태평경』에 나오는 해원결(解冤結)과 해원상생을 비교 분석하여 그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그 차이점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언급할 주요한 사항은 해원결이 선천에 원이 쌓이게 된 근본 원인을 ‘인간의 잘못’으로 보는 것과 달리, 해원상생은 그 원인을 “상극이라는 우주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다는 것이고 이 원을 해결하는 방식도 해원결이 『태평경』의 최고신인 황천이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것에 반해서 해원상생은 음양의 주재자의 천지공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해원결이 인간 중심인 반면에 해원상생은 그 법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신명과 동물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면서 해원상생의 독특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점은 해원이란 관념을 상생과 연결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원이 쌓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2) 다시 말하면 원을 풀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해법을 따른다는 것이다.
차선근은 또한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을 무속의 해원과도 구별하고 있다.43) 즉, 죽은 자의 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속과 달리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원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를 잘되게 해서 서로 잘살게 되어 궁극적으로 모든 원이 해원된 후천지상선경을 지향하는 범우주적 해원인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우주 절대자의 삼계공사와 해원공사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통해서 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원상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이츠의 ‘존재의 통합’을 향한 노력은 해원상생을 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예이츠가 체험한 음양의 부조화가 만들어 낸 갈등과 반목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그의 희곡 『유골의 꿈』을 통해 살펴보고 해원상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Ⅳ. 해원상생으로 본 『유골의 꿈』
『유골의 꿈』(The Dreaming of the Bones 1919)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인 부활절 봉기44)가 일어난 1916년을 이 극의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령과 진혼의 모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노’연극 『니시기기』(Nichikigi)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 극에서 중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후 영혼 세계 중 ‘몽환회상’(Dreaming Back)45)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예이츠의 『환상록』의 「영혼의 심판」 (The Soul in Judgement)에 자세히 기술 되어 있다. 사후 영적 재생에 이르는 과정은 6단계46)로 세분할 수 있는데 ‘몽환회상’은 제2단계 “명상”(Meditation)에서 일어난다. 예이츠는 ‘몽환회상’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극의 중심 사상은 사자(死者)가 필연적인 시간에 좀 더 개인적인 생각과 생전의 행위를 통하여, 몽환 회상한다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앙에서 유래한다. 코르넬리우스 아그립파에 의하면, 사악한 자는 불 태워지거나 악마에게 고통 받는 벌을 받는다. 그와 똑같은 생각이 일본의 ‘노’극에도 있다. 그 극에서 한 여자 혼령은 길에서 만난 불교 승려로부터 꿈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음으로서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를 듣는다. 내 극에 연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만든 양심의 미로에 빠져 있다.47)
The conception of the play is derived from the world-wide belief that the dead dream back, for a certain time, through the more personal thoughts and deeds of life. The wicked, according to Cornelius Agrippa, dream themselves to be consumed by flames and persecuted by demons; and there is precisely the same thought in a Japanese ‘Noh’ play, where a spirit, advised by a Buddhist priest she has met upon the road, seeks to escape from the flames by ceasing to believe in the dream. The lovers in my play have lost themselves in a different but still self-created winding of the labyrinth of conscience.48)
이 극은 부활절 봉기에 가담했던 한 청년 앞에 아일랜드가 700년 동안 영국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디어머드(Diarmuid)와 드볼길라(Dervorgilla) 유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직 유령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청년이 드볼길라인 ‘젊은 여자’(Young Girl)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고 묻는다.
청년: 어떤 죄인데 그처럼 오래 기억되나요? 어떤 죄가 연인들의 입을 계속 떼어 놓고 외로이 떠돌게 하나요?
젊은 여자: 그녀의 연인인 왕은 전쟁에서 그녀의 남편에게 패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녀와 자신을 위해 맹목적이고 증오에 차고 지독히 깊은 사랑에 빠져 바다 건너 외국 군대를 데려왔지요.
청년: 노르만 족49)을 데리고 들어온 디어미드와 드볼길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젊은 여자: 그래요 그래. 나는 조국을 노예로 팔아버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 한 쌍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비참하거나 저주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동포들 중 누군가 마침내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네.’ 라고 말한다면 말이지요.50)
Young Man: What crime can stay so in the memory? What crime can keep apart the lips of lovers wandering and alone?
Young Girl: Her king and lover was overthrown in battle by her husband, and for her sake and for his own, being blind and bitter and bitterly in love, he brought a foreign army from across the sea.
Young Man: You speak of Diarmuid and Dervorgilla who brought the Norman in?
Young Girl: Yes, yes, I spoke of that most miserable, most accursed pair who sold their country into slavery; and yet they were not wholly miserable and accursed if somebody of their race at last would say, ‘I have forgiven them.’51)
미데(Meath)의 왕의 딸이고, 브레프니(Breffny)의 왕인 오루크(O’Rourke)의 아내였던 드볼길라는 레인스터(Leinster)의 왕인 디어머드에 의해 납치된다. 이로 인해 오루크는 그의 동맹자들과 함께 보복으로 레인스터를 침범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디어머드는 자신과 드볼길라의 안위를 위해 당시 영국의 왕인 헨리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의 군대가 아일랜드 땅으로 들어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52) 그로부터 아일랜드가 영국에 의해 지배되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조국인 아일랜드를 영국에 팔아넘긴 죄를 짓게 된 디어머드와 이 죄에 연루된 드볼길라까지 그 죄에서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고 700년 후에 조국의 독립운동에 가담한 청년 앞에 나타난 것이다.
드볼길라가 자신의 ‘몽환회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년의 용서를 갈구하는 것의 배경은 이 극과 거의 동시대에 쓰여 진 예이츠의 『페르 아미타 실렌치아 루네(달의 친절한 침묵)』(PER AMICA SILENTIA LUNAE)에 설명되어져 있다. 예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강렬한 필요성이 다 닳아 없어질 때,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살아 있는 동안 시작되었던 사건의 충동을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 없다.
The dead, as the passionate necessity wears out, come into a measure of freedom and may turn the impulse of events, started while living, in some new direction, but they cannot originate except through the living. (PER AMICA SILENTIA LUNAE IX)53)
위에 설명한 것처럼 유령들은 그들의 ‘사건의 충동’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살아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와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유령을 보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54) 이 극에서 드볼길라는 살아있는 자 중에 ‘동포’(somebody of their race)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령들이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떤 이유로든 연관이 있는 살아 있는 자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령들의 갈망과 달리 이 극에서 청년은 유령들의 정체를 알게 되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다. 청년은 분위기에 빠져 유령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려고 하였지만 유령의 정체가 밝혀지자 인간적인 공감은 억압되고 애국심이 자극되어서 그들의 절규를 거절한다. 그 결과로 용서받지 못한 유령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춤을 추면서 떠돌다가 날이 새는 순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주인공 역할인 청년이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극이 끝나기 때문에 예이츠가 청년의 선택을 지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극에서도 예이츠가 제시하는 것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과 갈등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이츠는 객관적 사회에서 희생되는 주관성에 대해 주목할 것을 원하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의도는 마스크 사용에서 알 수 있다. 예이츠에게 있어서 마스크는 자아(self)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반자아(anti-self)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의 주인공은 그가 도달해야 할 반자아를 상징하는 마스크를 극 처음부터 쓰고 무대에 등장한다.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관객은 극의 주인공이 이르게 되는 목표지점을 처음부터 알게 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이 극에서는 주인공인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장치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청년이 극의 주인공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롭게 딛고 일어서서 그 유령들을 ‘몽환회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영웅적 자질의 부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작가가 유령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 독립군 청년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해석과 대비되어 유령들의 일련의 행위가 검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리게 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인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령은 햄릿에게 나타난 아버지 유령처럼 인간에게 위험의 요소로 판단될 수도 있다.55)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유령들의 검은 마법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한 청년의 태도를 영웅적 자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이츠가 이 극을 썼던 시기는 1919년으로 아일랜드와 영국이 여전히 1916년에 발생한 부활절 봉기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 비극의 시작이 된 디어머드와 드볼길라를 용서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록 청년이 “디어머드와 드볼길라는 용서받지 못해요.”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일련의 과정이 있다. 유령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고통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고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유령의 상태에 공감했었다. 그래서 청년은 “잠깐 동안 그것이 사실이라 믿었지요./ 아니 반쯤 믿었어요.”(I could not help but fall into the mood/ And for a while believe that it was true,/ Or half believe.)56)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청년의 대사는 그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출법은 청년의 인간적인 갈등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극을 관람하는 관객이 각자의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따라 개인적 결정을 하도록 결말을 열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다.
부활절 봉기에 대한 예이츠의 견해는 그의 시 「부활절, 1916」(Easter, 1916)에 잘 나타나 있다. 부활절 봉기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헌신과 용기를 애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만들어 낸 개인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이 동시에 담겨 있다. 이 시에서도 작가가 갈등하는 것은 공적 명분을 위한 헌신이란 객관성에 의해 희생되는 한 개인의 삶 또는 인간성이라는 주관성이다. 영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만 그들은 대의명분을 위해 인간성을 잃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도 잃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보인다. 특히 「부활절, 1916」 중에서 3연은 극단적으로 변질한 민족주의자들을 ‘돌’(stone)에 비유하면서 객관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닌 가슴은/ 여름 겨울 내내/ 살아 있는 시냇물을 방해하는 돌멩이에/ 매혹된 것처럼 보이지.”57)(Hearts with one purpose alone/ Through summer and winter seem/ Enchanted to a stone/ To trouble the living stream.)58)라고 하는 표현은 민족주의자들의 변하지 않는 돌 같은 애국심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다음 행에서 거론하는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물들과 대비되어 정체되어 있고 그 흐름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의 순환주기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데 돌과 같이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사고는 오히려 자연적 순환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 4연인 마지막 연에서는 부활절 봉기로 죽음을 맞게 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쓸모없는 죽음’(needless death)59)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표현한다. 그리고 4연의 마지막 행뿐만 아니라 1연과 2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아름다움이 태어났네.”(A terrible beauty is born.)라는 표현은 이러한 정치적 성취와 이를 위한 숭고한 개인적 헌신과 희생 사이에서 그 경중을 확신할 수 없는 작가의 갈등이 담겨 있다. 최윤주도 ‘끔찍한 아름다움’이라는 모순어법이 작가의 양가적 감정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0)
역사적으로 부활절 봉기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1) 하지만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유혈 봉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위에 인용한 시에서 “영국이 그 모든 행동과 말들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도 있었을 터이므로.”(For England may keep faith/ For all that is done and said.)62)라고 한 것처럼 그 당시 영국이 신의를 지킬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아일랜드 자치법안(Home Rule Bill)을 영국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던 중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다.63) 그러므로 마음이 돌이 된 민족주의자들의 선택이 많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서 희생시켰다는 예이츠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노’극에서는 불교 승려가 등장해서 유령들이 반복하는 고통과 죄의식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지만 예이츠의 극에서는 유령의 ‘몽환회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역할을 700년의 원한의 결과가 되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부활절 봉기에 참여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된 청년에게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청년이 그의 연민이라고 하는 주관성과 애국심이라는 객관성 사이에서 겪는 고뇌와 갈등의 여정을 관객이 함께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동시대의 관객이 보다 조화로운 또는 ‘존재의 통합’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극에서 마스크의 사용이 다른 것처럼 예이츠의 극에서 ‘존재의 통합’의 상태를 상징하는 춤도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존재의 통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청년의 용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추는 디어머드와 드볼길라의 춤은 일본의 ‘노’극에서 영적 결합 순간의 감사와 환희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끔찍한 성적 좌절감의 무서운 이미지”(a terrifying image of a ravaging sexual frustration)를 나타낸다.64) 즉, 이 극에서의 춤은 두 세계의 결합이 아니라 명백한 붕괴이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몽환회상’을 표출한다. 그 결과로 극의 초점은 청년에게서 유령에게로 옮겨간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극의 주인공인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마스크의 변용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통상적으로 주인공이 쓰는 마스크를 유령들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웅적’(heroic) 마스크라는 것이 극의 지문에 명시되어있다.6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양의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극은 청년과 대비되어 음적 존재인 디어미드와 드볼길라 유령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디어머드란 한 인간이 파생시키는 원과 한 그리고 그 운명의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반복되는 고통을 받는 여왕 드볼길라, 그리고 그 원이 700년 후의 아일랜드 청년들을 죽음에 몰아넣게 된 원과 한의 고리는 앞에서 언급한 단주의 원을 생각나게 한다. 재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66)
위의 전경 구절에서 보면 단주가 원을 품고 순과 두 왕비를 죽게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광주가 설명하듯이 역사적 기록은 달리 해석될 부분이 있다. 아버지 요의 거절로 제위에 오르지 못한 단주는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끝내 실패하자 낙담하여 자결하였고, 그 이후에 순은 병사하고 죽은 요를 그리워한 두 왕비(아황과 여영)가 스스로 소상강에 빠져 죽은 것이라고 한다.67) 그래서 그 원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광주는 단주 원이 제위를 받지 못해 천자로서 뜻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불초’하다는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한 원한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고남식도 요의 신하들이 단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불초’하다고 하는 요의 판단이 객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으로 단주가 원한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68) 이렇게 단주의 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증산은 단주의 원이 순과 두 왕비의 죽음의 결과를 낳은 것이라 하였다.6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증산의 해원상생은 원을 맺은 자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 선천의 상극지리에 의해 원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겹겹이 쌓이게 된 원을 풀어야 함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재근도 단주의 이야기는 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화적이거나 전설적인 소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때 “역사적 사실의 인과 관계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제일원인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70)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단주의 이야기는 쌓인 원은 풀어야 하고, 원을 풀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원이 생성되고 그것이 씨앗처럼 작용해서 어떻게 또 다른 원을 생성시키는지를 인식하고 그 모든 원을 풀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디어머드와 드볼길라의 원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원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어머드의 원도 풀어내야 할 원이다. 왜냐하면 그의 왕위를 되찾겠다고 하는 원한이 드볼길라의 원을 생성하고 이후 또 다른 원을 만들어서 700년 이후의 아일랜드인들에게도 원을 맺게 하였기 때문이다. 디어머드의 원을 풀어냄으로써 그것이 파생시킨 ‘모든 불상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극에서는 디어머드의 폐위가 드볼길라를 납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죽은 형을 이어 적법하게 왕위에 오른 디어머드를 아일랜드 전체의 통치권을 가진 왕(High King of Ireland)이 경계해서 부당하게 폐위시킨 것이라고 한다.7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디어머드도 억울하게 빼앗긴 왕위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조국을 팔아넘겼다는 비난과 저주를 700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한 원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한편 요가 단주에게 제위를 넘기지 않고 순에게 선양함으로써 순은 그들 부자의 원한 관계에 연루되게 되고 그 결과 “창오(蒼梧)에서 붕(崩)”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원을 갖게 되듯이 이 극의 드볼길라의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드볼길라는 디어머드에게 납치됨으로써 그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 그가 받게 된 오명도 같이 짊어지게 되어 이 극에서 묘사된 것처럼 700년을 고통 속에 떠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의 죽음으로 소상강에 빠져 죽은 두 왕비의 원은 이 희곡에서는 부활절 봉기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청년들에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주의 원이 또 다른 원을 발생시키는 씨앗이 된 것처럼 700년 전 시작된 디어머드의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현재의 아일랜드 청년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희곡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디어머드와 드볼길라 두 유령 중에서 예이츠는 드볼길라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브는 예이츠가 『매의 우물에서』(At the Hawk’s Well)의 주인공 쿠훌린(Cuchulain)의 마스크가 드볼길라를 위해 이상적이라고 했고 그 마스크를 ‘고대 그리스 동상’(an archaic Greek statue)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72) 또한 예이츠가 이 극을 위한 소재를 얻은 것이 레이디 그레고리(Lady Gregory)의 비극 『드볼길라』(Devorgilla 1907)였다. 극의 제목에 ‘드볼길라’가 있는 것은 그레고리의 비극의 초점이 드볼길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서혜숙도 이 극이 드볼길라의 회환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73) 드볼길라의 비극은 그녀가 극 중에서 언급하는 트로이의 헬렌(Helen)74)과도 연결되는데 드볼길라는 트로이의 헬렌처럼 그녀가 원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나라의 왕에게 납치되어 연인의 조국을 멸망하게 하는 죄에 공범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드볼길라에게 영웅 쿠훌린의 마스크를 쓰게 한 예이츠의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트로이의 헬렌처럼 드볼길라를 여성으로서 갖게 되는 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한을 포함하여 좀 더 확대된 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원을 발생시킨 디어머드를 부활절 봉기를 주도한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결정으로 그 폭력사태에 참여해서 죽음을 맞게 된 청년들을 드볼길라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이츠는 원의 생성과정에서 무시되는 원의 희생자들도 주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경』에는 용감한 장군의 정의로운 행위도 원을 맺게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다.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몰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75)
국가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판단과 결정이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 세계, 예이츠 언어로 말하면 주관적 세계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대장이란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용감하게 적진을 진격해서 장쾌한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살해된 인명은 원한을 갖고 악척이 되어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예이츠도 그러한 희생에 주목했고 그러한 점이 그가 존 퀸(John Quinn)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젊은이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마음이 선량한 이들을 잃었다. 세상이 휘몰아쳐 쓸려나간 것 같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생각한다.
We have lost the ablest and most fine-natured of our young men. A world seems to have been swept away. I keep going over the past in my mind and wondering if I could have done anything to turn those men in some of the direction.76)
부활절 봉기의 결과로 잃게 된 청년들을 안타까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존재한 본인이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책임감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이츠는 이 극을 통해서 애국심이라는 객관성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동시대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양산시키는 주관적 영역에서의 비극적 상황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을 위한 명분을 가진 행동이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희생되는 생명들은 그만큼의 원한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예이츠는 이 극의 결말을 관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열어 놓고 있지만 대순사상의 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이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의 법리와 예이츠의 ‘존재의 통합’ 사상은 동양과 서양, 종교적 법리와 한 작가의 사상이라는 이질적 요소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통섭 과정에서 서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두 사상이 지향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원상생이라는 것이다. 물론 예이츠는 대순사상을 알지 못했고 게다가 음양의 주재자에 의한 해원상생과 예이츠의 사상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절적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이츠가 갈등과 반목이 팽배하던 시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임을 주장한 것은 대순사상의 해원상생에 이르기 위한 노력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이츠의 희곡 『유골의 꿈』에서 700년 전의 유령을 현재의 청년과 만나게 하는 것은 예이츠의 신비사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고 그러한 신비사상은 대순사상에서 모든 일을 신도로 보고 원을 푸는 해원상생의 법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이츠는 과거의 원한이 현재와 연관이 있음을 인지한 것이고 그러한 설정은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원한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의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해원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해원상생은 근본적으로 음양의 주재자의 해원공사에 의해 가능하지만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경』에서 원의 시작으로 명시한 단주의 원은 『유골의 꿈』을 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단주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의 인과 관계를 넘어서 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내서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원을 풀어낸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예이츠 희곡의 등장인물들을 원의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해원의 관점에서 관객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짐에 따라서 예이츠가 이 극을 통해 전하고자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